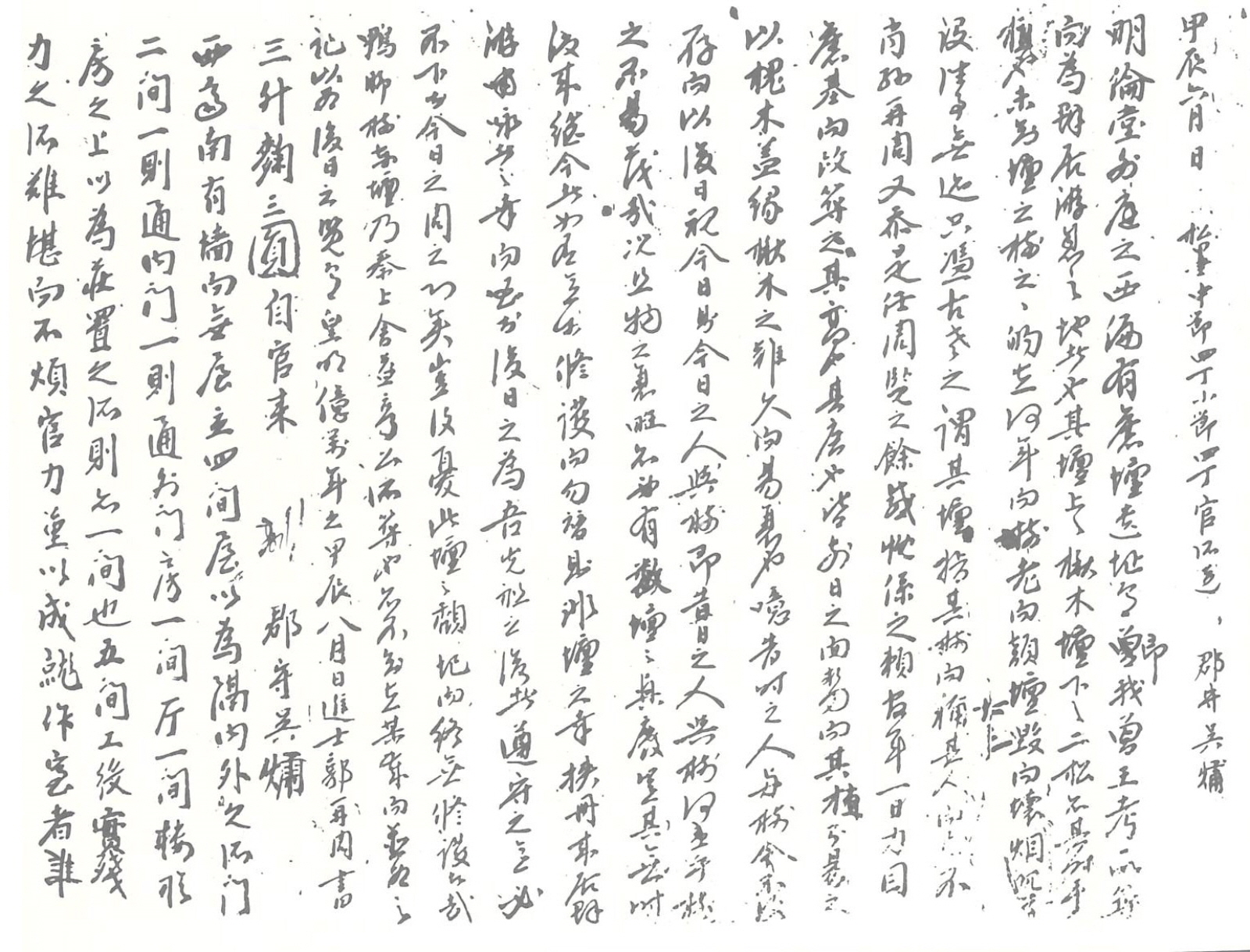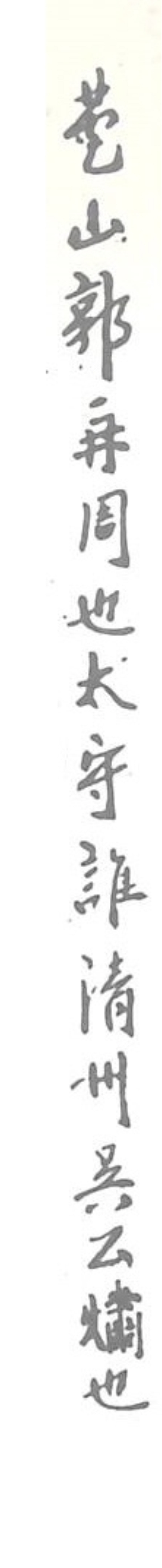1664년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에서 있었던 관의 부조, 조경, 건물 공사 관련 기사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41~1681년 「雜錄」에 수록된 1664년 기사다. 기사는 크게 관의 부조, 조경, 건물 공사 관련 기사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1664년 6월 풍기군 관아에서 풍기향교로 松墨 中節 4丁과 小節 4丁을 보내 왔다.
8월의 기사는 풍기향교 校任이었던 進士 郭再周가 쓴 것이다. 이에 따르면 풍기향교 明倫堂 바깥뜰 서편에 壇의 옛 터가 있었는데, 이것은 곽재주의 증조할아버지가 축조한 것이며, 선비들은 이곳을 遊息이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 또한 단의 위쪽에는 가래나무, 아래에는 두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유식의 장소로 알맞게 경관을 꾸몄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해에 단은 무너지고 나무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한 古老의 증언에 의거해 그 위치만 아는 정도라고 했다. 이에 풍기향교 교임을 맡은 곽재주가 한가 할 때 풍기향교를 둘러보고 예전처럼 복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풍기군에 요청하여 물력을 지원받아 그 터를 개축하였으며, 그 곁에는 예전처럼 나무를 심었는데, 수종은 회화나무로 바꾸었다. 가래나무는 오래가지 않고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조경을 마친 곽재주는 옛 사람들의 정취를 이어 받고자 단을 새로 수축하고 경관을 꾸몄으나, 예전과 똑 같지는 않아 아쉽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일을 후세가 꼭 알아두고 잊지 말기를 부탁하면서, 이곳에 버드나무를 심고 本壇을 수축한 것은 秦益亨이라는 사람의 공임을 덧붙여 놓았다.
관에서 누룩 3升을 보내왔다.
풍기향교 西齋 남쪽 담장에다가 5칸의 건물을 조성하였다. 5칸은 각각 內門·外門·房·廳·樓로 구성되었다. 이때도 물력이 부족하여 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1664년 당시 豊基郡守는 吳?였다.
자료적 가치
향교의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는 소재 고을의 유력한 사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방 官學이었던만큼 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지방관 입장에서 향교의 장려는 守令考課 중 하나인 ‘興學校’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지방관은 향교에서 비경상적인 물력을 소비할 때 이를 부조해 주거나, 큰 공사나 행사가 있을 때 노동력을 동원해주는 방법으로 향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갔다. 이에 1664년의 풍기향교 기사에서도 풍기군이 향교에 물품을 부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경과 건물 공사에도 물력 등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