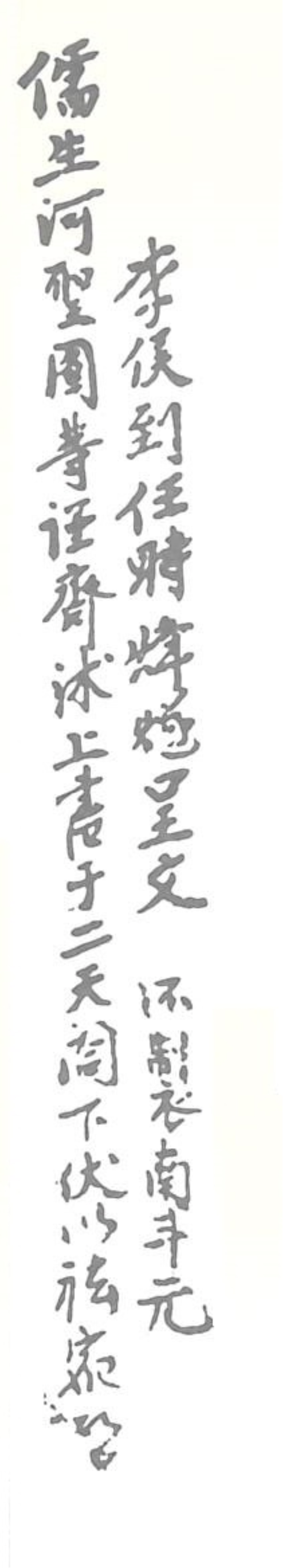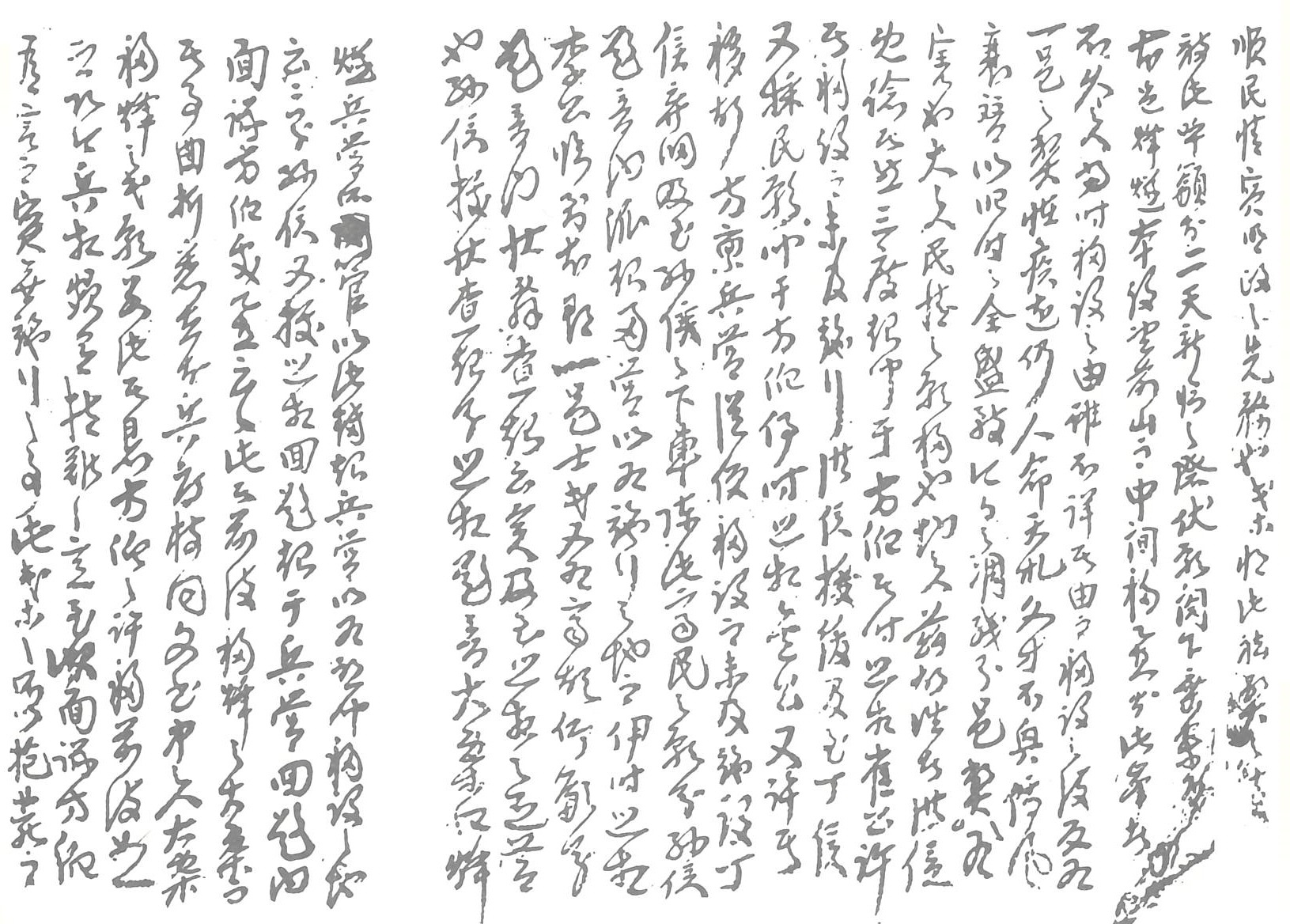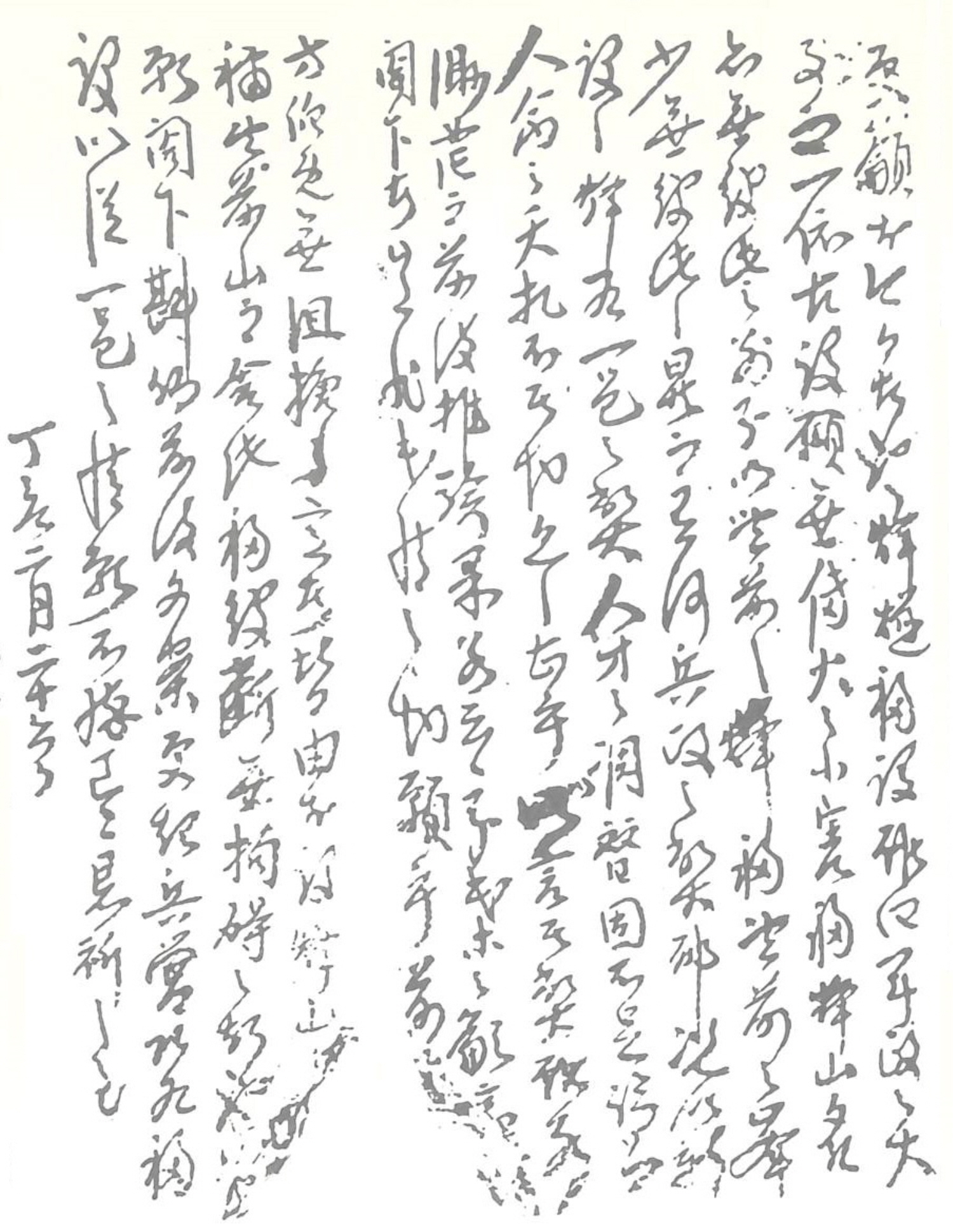1707년 2월 26일 慶尙道 豊基郡 豊基鄕校 儒生 河成圖 등이 烽燧臺 이설 문제로 새로 부임한 豊基郡守 李禎에게 올린 上書
鄕校雜錄 第二
자료의 내용
慶尙道 豊基郡 소재 豊基鄕校에서 엮은 1692~1720년 「鄕校雜錄」 第二에 수록된 1707년 2월 26일 발급 上書다. 본 상서는 烽燧臺 이설 문제로 풍기향교 儒生 河成圖 등이 새로 부임한 豊基郡守 李禎에게 올린 것이다. 「향교잡록」 제2에는 이에 앞서 1707년 2월 초4일 鄕射堂에서 발급한 通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함께 鄕論을 모아 새로 부임하는 풍기군수에게 봉수대 이설을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 상서는 풍기군 향사당과 풍기향교 등이 중심이 되어 향론을 모은 후 올려 진 것이다. 상서에는 이정 부임 전에 진행된 봉수대 이설 논의의 논의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상서에서는 먼저 풍기군 望前山에 소재한 봉수대가 원래 위치가 아니라고 하였다. 어느 시기에 알 수 없는 사유로 지금의 위치로 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儒風이 침체하는 등 고을에 큰 폐단을 주고 있는 형세라 하였다. 봉수대가 이설되어 왕성하던 고을의 형세가 이제 凋殘해 졌다며, 봉수대 이전이 고을 사람들의 큰 염원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어 세 명의 전임 풍기군수 재임 때 봉수대 이설을 청원한 사실과 봉수대 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상급 관아의 조치를 나열해 놓았다. 이설이 여러 해 동안 지체되었지만, 모두 관이 동의한 사안임을 강조하여 시급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洪景濂 재임 때의 경과다. 홍경렴은 1699년 풍기군수로 부임하였는데, 풍기군 사람들의 청원을 받고 세 차례나 慶尙道觀察使 崔錫恒에게 이설을 건의하였었다. 이에 경상도관찰사 최석항은 兵營에 보고해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병영도 從便해서 이설해 줄 것을 허락하였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두 번째는 1701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丁思愼 때의 경과인데, 정사신도 이 사안을 추진하였으나 시행에는 이르지 못하였었다. 세 번째는 1706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孫萬雄 때의 경과다. 손만웅이 부임하자 고을 사람들은 또 다시 봉수대 이설을 청원하였고, 손만웅은 監營과 병영에 보고한 후 처리할 것이라는 題辭를 내렸다. 그런 가운데 경상도관찰사 李?가 풍기군에 순행하러 왔는데, 때를 맞추어 풍기군 사람들이 봉수대 이설을 청원하였고, 경상도관찰사 이야는 풍기군수 손만웅에게 해당 사안을 조사·보고하라는 제사를 내리게 된다. 이에 손만웅은 봉수대 문제를 조사해 경상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경상도관찰사 이야는 이 문제를 병영에 건의하라는 제사를 내리게 된다. 봉수대 이설이 軍政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풍기군수 손만웅이 병영에 봉수대 이설을 보고하였는데, 병영은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어서 경상도관찰사와 面義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봉수대 이전 문제는 이상과 같이 진행되었으나, 병영의 사무가 持難하여 현재까지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풍기군수 이정에게 민원의 간절함, 봉수대 이설에 동의를 보였던 전임 풍기군수와 상급 관아의 긍정적인 검토, 봉수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들며, 재차 봉수대 이설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향교는 교육·교화의 기능을 가진 官學이었지만, 지역의 鄕論과 公議가 결집되는 곳이었다. 지역 내 유력한 재지사족이 향교 운영에 참여하였기에 향교는 재지사족의 자치기구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이에 고을 사람들의 오랜 염원인 봉수대 이설 문제를 풍기향교 유생이 직접 청원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