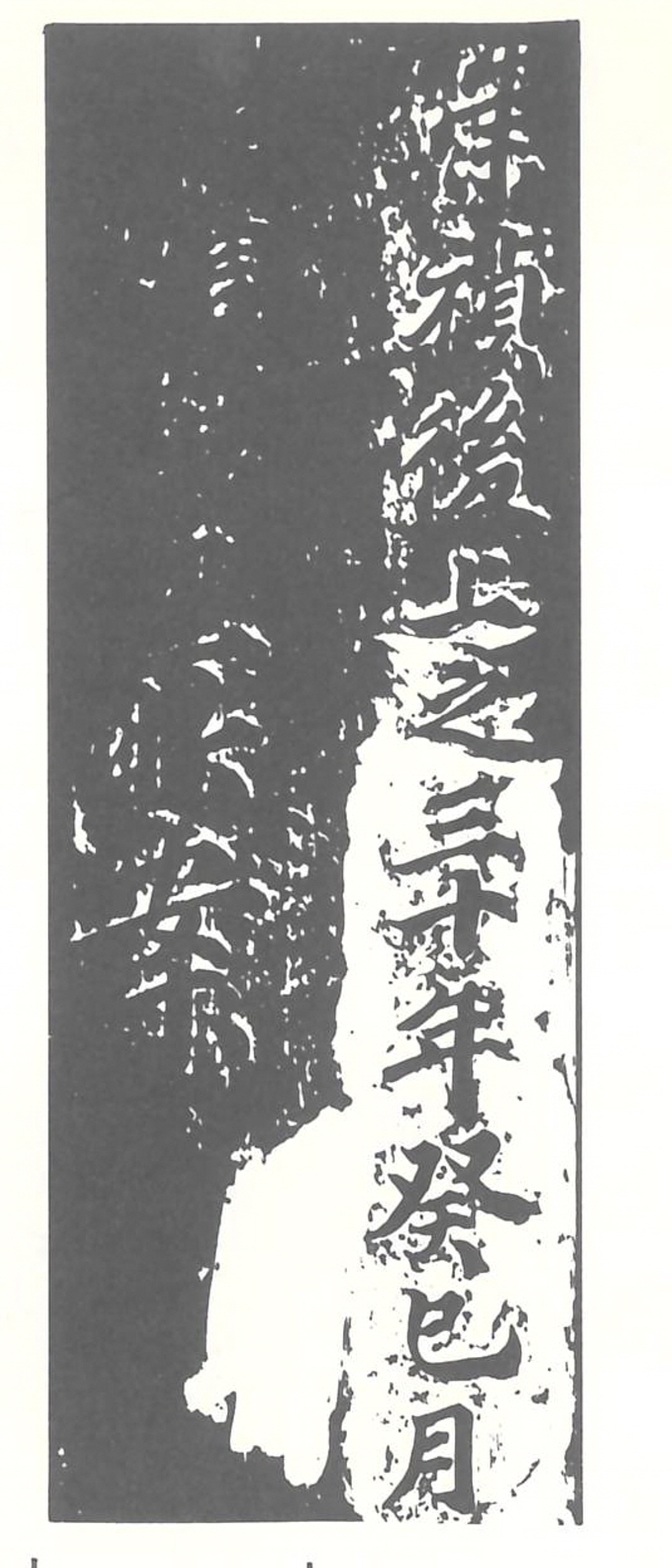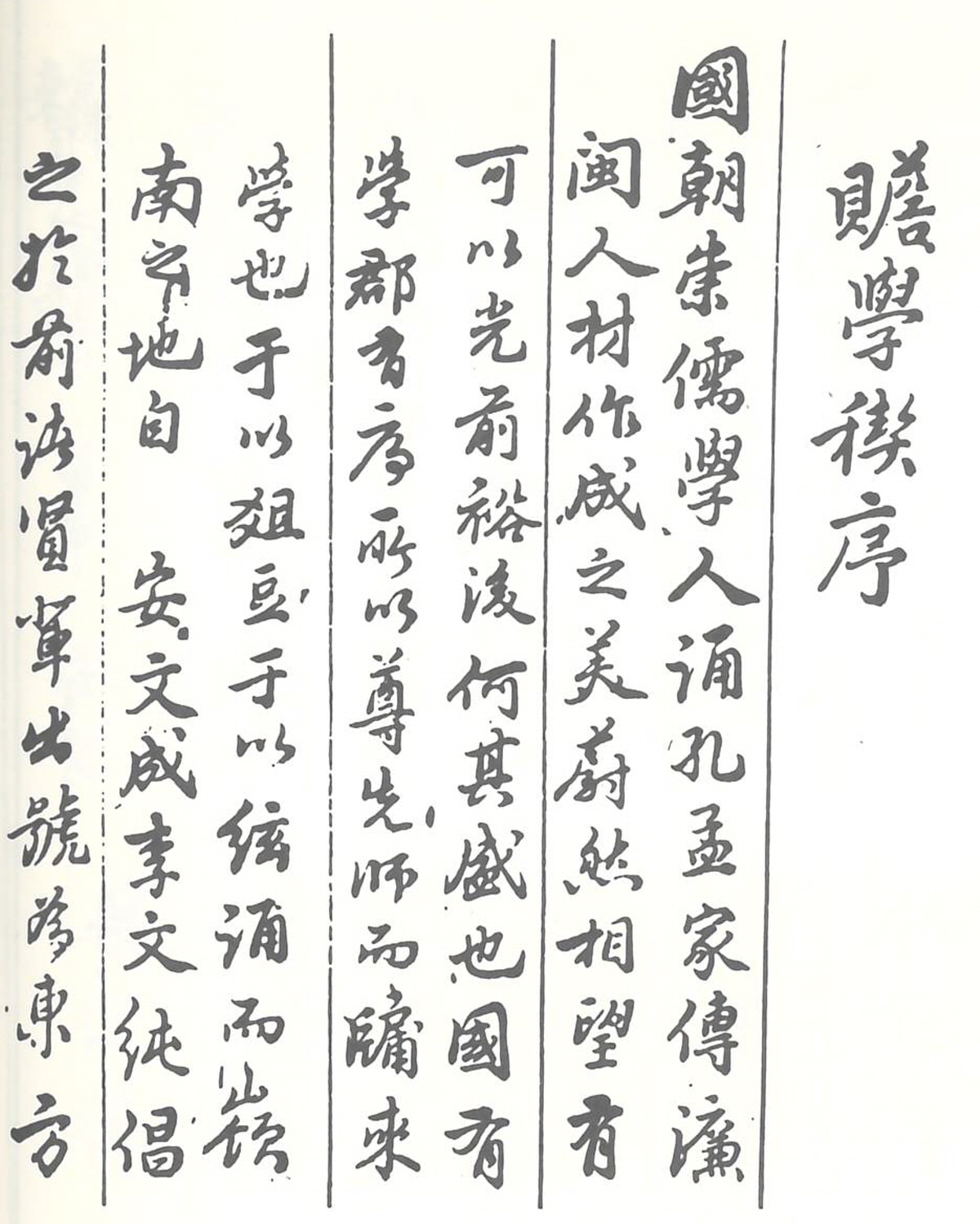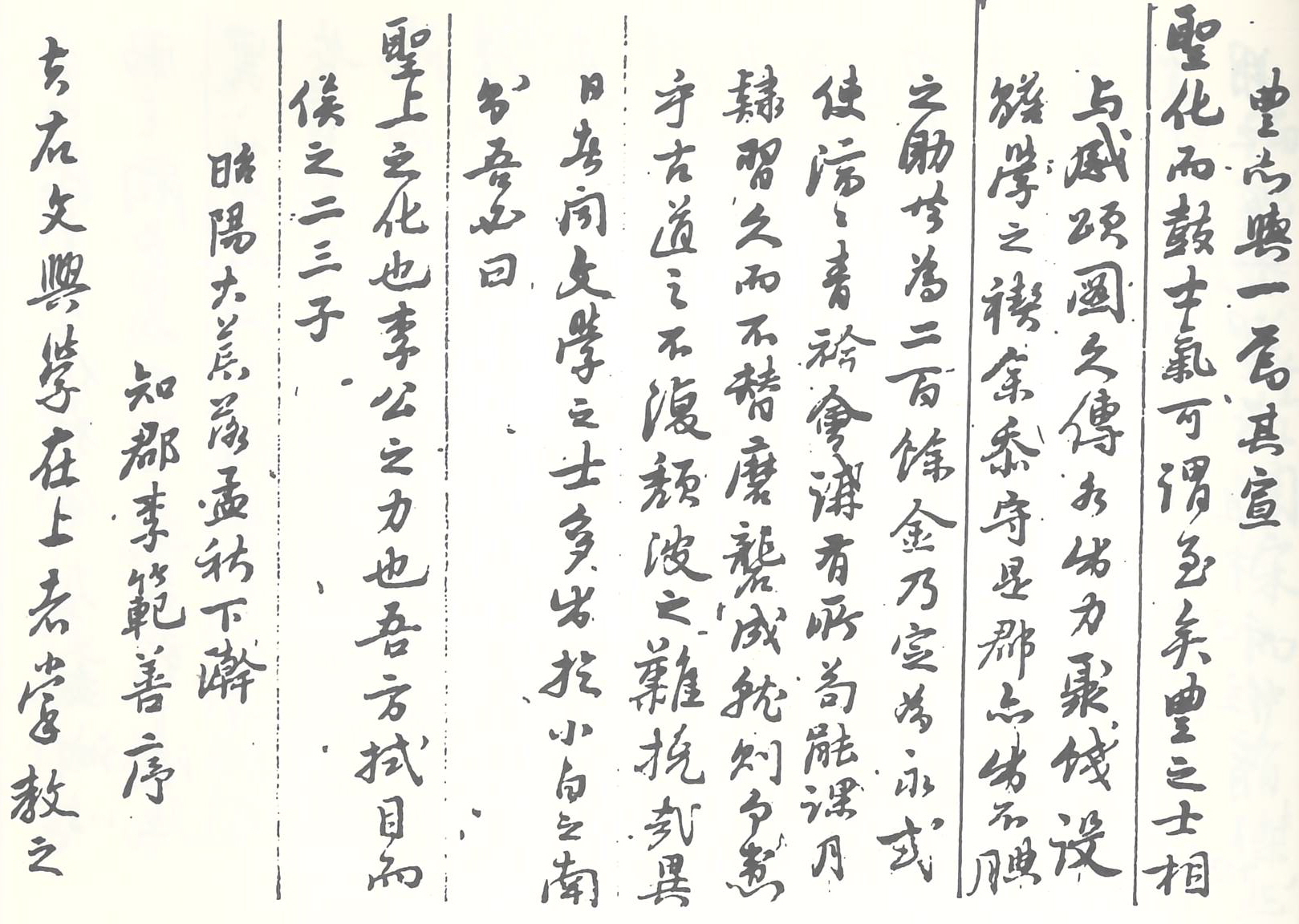자료의 내용
1893년 慶尙道 豊基郡에서 결성된 贍學?의 계원 명부다. ‘贍學所案’으로 표제 되어 있으며, 豊基鄕校에 전해지고 있다. 섬학계는 慶尙道觀察使 李??永이 지원해 준 자금을 바탕으로 풍기군 지역 교육 장려를 위해 결성된 일종의 學契다. ‘섬학소안’은 豊基郡守 李範善과 黃範鱗의 「贍學?序」, 黃鐘夏의 「書贍學所名帖後」, 그리고 계안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풍기군수 이범선의 서문은 1893년 7월 작성되었다. 해당 서문에는 섬학계 결성 경위와 의의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는데 그 대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에서 유학을 숭상하고 있기에 나라에는 學이 있고 郡에는 序가 있으며, 이곳에서 先師를 제향하고 그들의 학문을 絃誦한다. 그 결과 嶺南 지역에서는 安珦·李滉과 같은 名賢이 배출되어, 동방의 ‘鄒魯之鄕’라는 칭호를 들었으나, 근래 士風이 날로 쇠퇴해져 ?堂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閭閻에서는 邪說이 恣行되고 있으니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모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聖上께서 팔도에 영을 내려 儒冠을 쓰고 儒服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유학을 크게 일으키게 하였다. 이때 이헌영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이헌영은 경상도에 많은 폐단이 있는 것을 보고, 興學에 뜻을 두게 되었고, 科條를 만들어 고을의 講長과 몇몇 任員들로 하여금, 학문 능력을 시험 치게 하는 등 講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3,500냥의 돈을 녹봉에서 내어 경상도 71개 고을에 나누어 주었으며, 이것을 勸學錢으로 사용케 하였다. 이로써 각 고을에 50냥의 돈이 지급되니, 풍기군도 그 혜택을 받았다. 풍기군의 선비들은 이 돈이 오랫동안 전하기를 도모하며, 각기 돈을 내었고, 나도 힘을 보태어 200여 냥에 달하는 돈이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섬학계를 설립하였으니, 많은 선비들이 모여 강학하고 매달 익히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옛 도가 일어나 다시는 쇠퇴해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여기 小白山 남쪽 고을에서는 문학하는 선비가 많이 배출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상의 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는 모두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의 공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범선의 서문에서 확인되듯이 섬학계는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이 경상도 列邑에 나누어 준 50냥과 풍기군수 이범선이 기부한 돈, 그리고 풍기군 사림들이 모은 돈 200여 냥을 바탕으로 결성되었다. 이어 수록된 황범린의 서문은 1893년 11월 下澣에 작성된 것이다. 황범린은 풍기군의 유력 사족 가문인 平海黃氏 출신으로, 일찍이 풍기향교 都有司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황범린의 서문도 이범선의 서문과 마찬가지로 섬학계 결성 경위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는데, 풍기군수 이범선이 이때 50냥의 돈을 녹봉에서 지원해 준 것과 殖利를 통해 섬학계의 자금을 증식할 것이라는 운영 방안이 추가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풍기군의 儒士들은 그렇게 형성된 돈을 영구히 하고자 殖利하기로 의논을 모았으며, 養士所를 설립하였으니, 이름을 ‘贍學’이라 했음을 밝혀 놓았다. 그리고 풍기군의 각 門中이 약간의 돈을 내어 섬학계의 재원을 형성했다고 한다. 황범린의 서문 후반부에서는 경전과 여러 선현의 故事를 인용하여 교육과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놓았다. 즉 섬학계의 결성이 北宋 때 胡瑗이 湖州와 蘇州의 敎授가 되어 名公을 배출시킨 것, 당나라 때 李渤이 廬山에 학교를 창설하여 文敎가 울창하게 일어나게 한 것과 같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황범린이 교육과 교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대목은 黃俊良(1517~1563)이 작성한 「紫陽書堂記」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황준량은 풍기군 출신으로 황범린의 顯祖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문 말미에는 ‘三不朽’에 비유하며, 경상도관찰사 이헌영과 풍기군수 이범선의 공을 칭송해 놓았다.
1893년 11월 下浣에 황종하가 작성한 「서섬학소명첩후」에서도 섬학계 결성 경위와 ‘섬학소안’ 편찬 의의가 언급되어 있다. 황종하는 평해황씨와 더불어 풍기군이 대표적인 사족 가문인 昌原黃氏 출신으로, 1880년 풍기향교 도유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서섬학소명첩후」에서는 먼저 三代의 제도와 『小學』의 구절, 송나라 때 朱子와 程子가 마련한 학문의 절차 등을 거론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우리 東方도 여러 儒賢이 배출되어 송나라의 풍습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래 도가 점점 떨어지고 儒風이 날로 투박해져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는데, 다행히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이 학문에 뜻을 두었기에, 경상도에 처음 부임할 때 外邑에 布告하여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月朔에 강학을 하게 하였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養士를 위한 비용을 劃付했음을 밝혀 놓았다. 여기다 풍기군수의 지원과 고을 선비들의 모금으로 섬학계 재원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根幹한 자를 특별히 뽑아 재원을 관리케 했으며,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科條를 세웠음도 추가로 언급하였다.
계안에는 계원의 성명, 출생 干支, 字, 본관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모두 175명의 계원이 확인되는데, 이들을 姓貫별로 나열하면 昌原黃氏 48명, 平海黃氏 25명, 順天金氏 16명, 英陽南氏·眞城李氏 각 9명, 順興安氏 8명, 安東權氏·豊基秦氏 각 7명, 平山李氏 4명, 商山金氏·永川金氏·宣城金氏·一直孫氏·仁川蔡氏 각 3명, 玄風郭氏·慶州金氏·咸昌金氏·豊山柳氏·礪山宋氏 각 2명, 醴泉權氏·安東金氏·義城金氏·淸風金氏·善山吉氏·高靈朴氏·平山申氏·寧越辛氏·丹陽禹氏·宣城李氏·仁同張氏·淸州韓氏·南陽洪氏·齊安黃氏 각 1명 순이다.
한편, 자료 말미에는 尊聖廳儒生으로 金思永과 韓明洙 2인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가 성책된 후 부기된 것 같은데, 섬학계와 존성청과의 관계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지방 교육 정책의 실태와 풍기군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조선시대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으로 지방관과 재지사족들이 합심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興學’에 관심을 둔 지방관은 향교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방 교육을 장려하기도 했다. 1890년 12월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되어, 1893년 3월까지 재임한 이헌영도 그 중 한명이다. 이헌영은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자마자, 교육과 교화를 위해 鄕約 시행과 강학 실시를 도내 각 고을에 지시하였다. 특히 매월 향교에서 강학을 실시케 하였으며, 그 성과를 考課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녹봉을 각 고을에 지원하여 지속적인 강학 시행을 도모하였는데, 이시기 경상도관찰사 이헌영의 활약은 그의 日錄인 『敬窩集略』 수록 「嶠蕃集略」을 통해 상세히 살펴 볼 수 있다.
풍기군에서의 강학 활동은 경상도관찰사 이헌영과 풍기군수 이범선과 같은 관권에 의해 장려되었기에, 풍기군의 재시사족 가문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강학 활동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가문들이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섬학계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 운영에 간여하는 계원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풍기군 지역을 대표하던 재지사족 가문이 망라되어 있다. 즉, ‘섬악소안’의 계안에 다수를 등재시킨 창원황씨·평해황씨·순천김씨·영양남씨·진성이씨·순흥안씨·안동권씨·풍기진씨 등의 가문이 당시 풍기군 지역 향론을 대표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