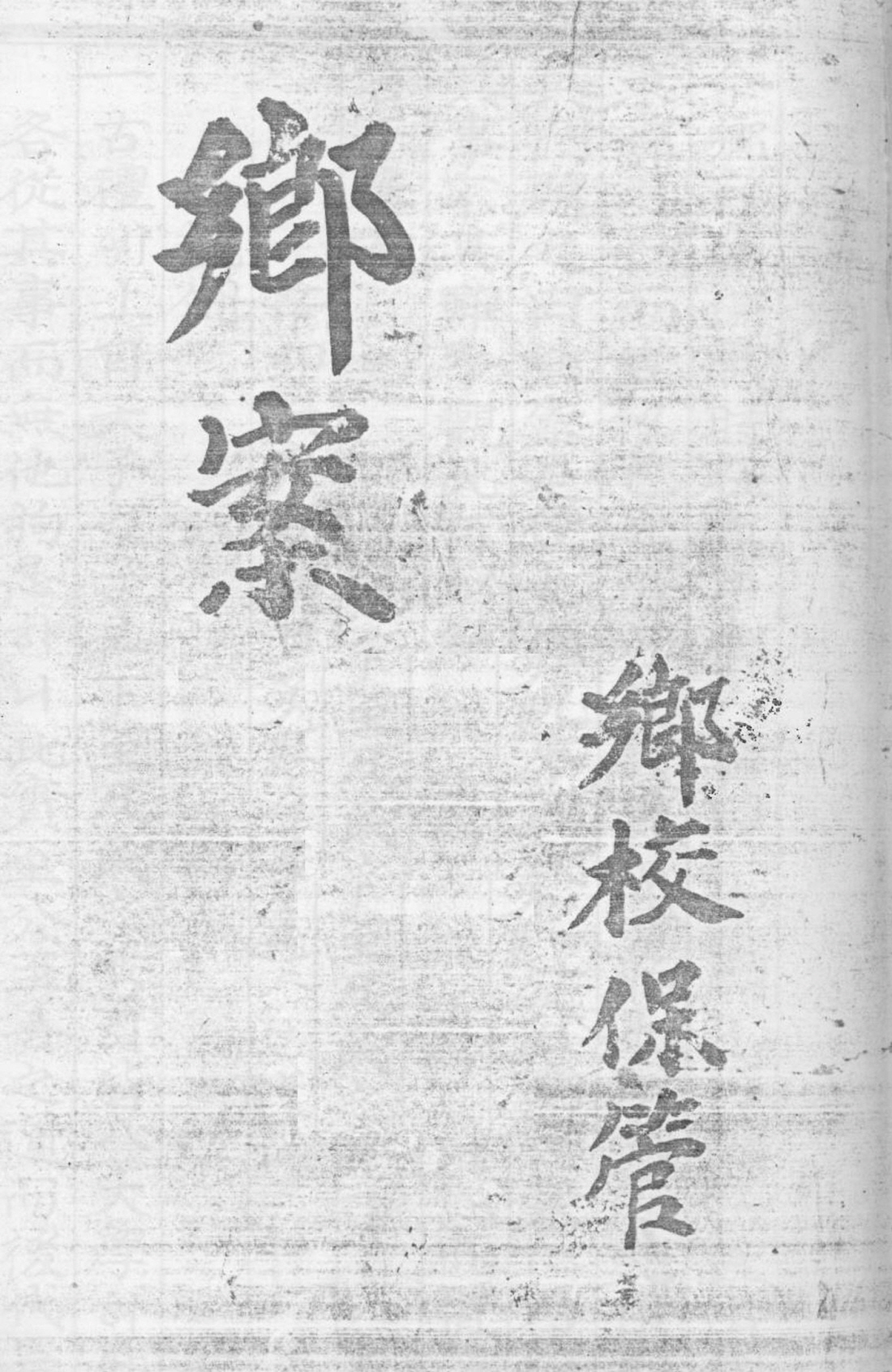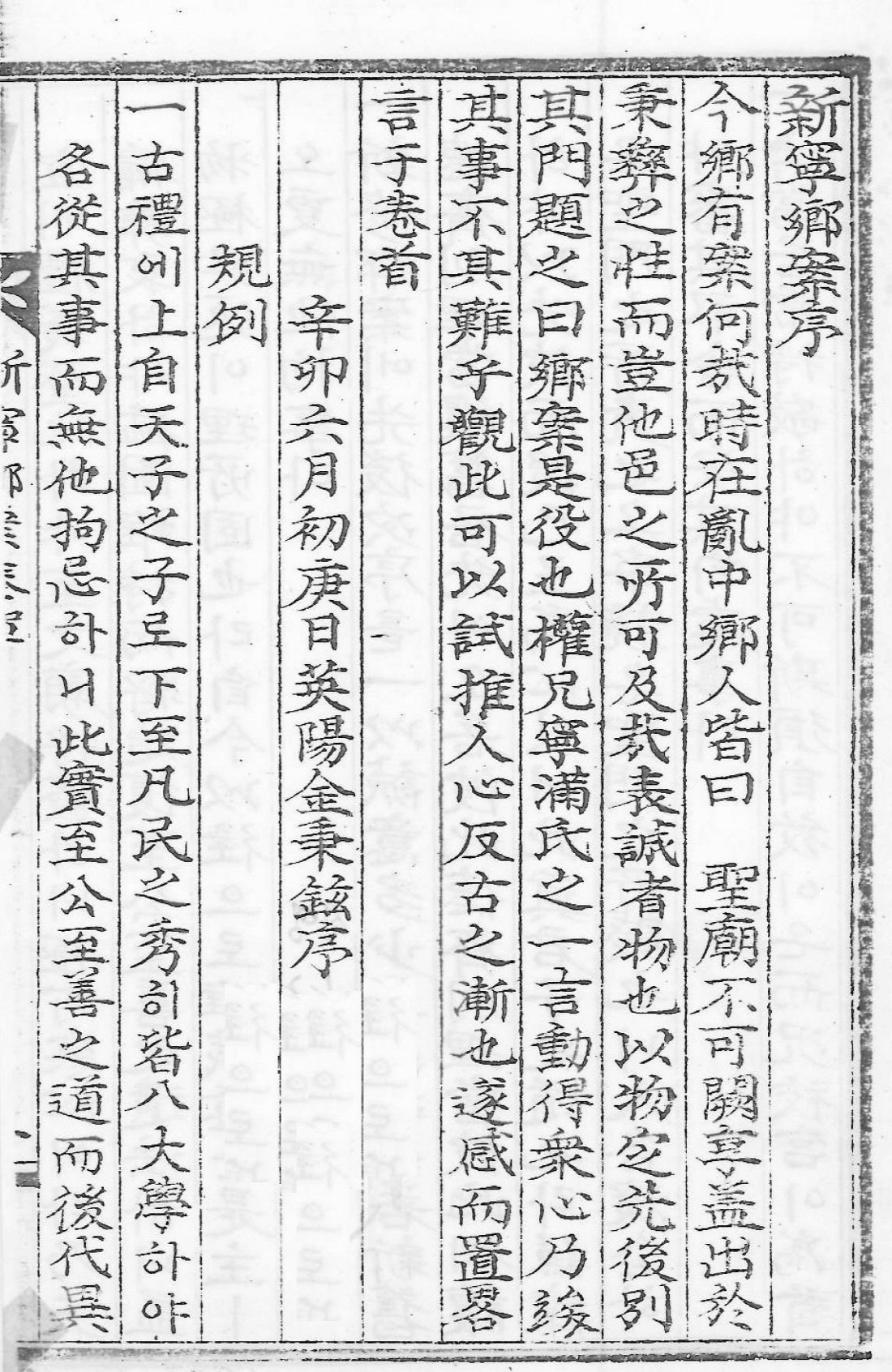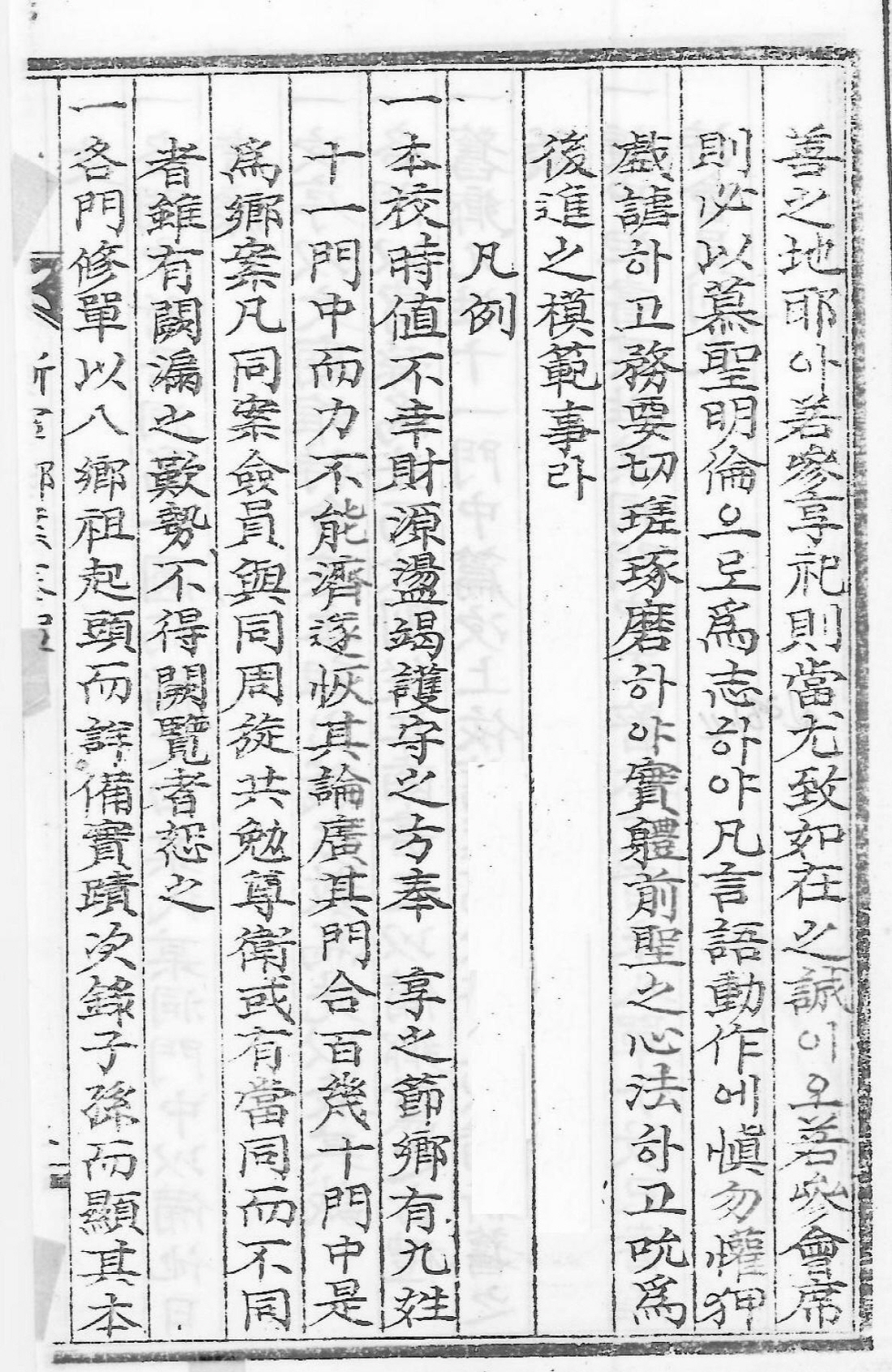[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재지사족들의 향촌자치기구인 留鄕所 또는 鄕廳의 전통을 계승하여, 1951년 慶尙北道 永川郡 新寧面과 그 일대에 거주하던 사족 가문의 후손들, 즉 지역 유림들이 新寧鄕校를 중심으로 편찬한 鄕案이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까지 慶尙道 新寧縣이라는 독자적인 고을로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과 경산시 와촌면 일대로 병합 또는 편입된 상태이다. 원래 향안은 조선시대까지 향촌지배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1951년에 작성된 본 자료는 전통적인 향안과 거리가 멀다. 향안 작성을 통해, 과거 신녕현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조들과의 계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 사족 가문임을 표방함과 동시에 향안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과거와 같이 향촌 지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료의 구성은 序文, 規例, 凡例, 鄕案, 任司錄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은 1951년 6월 初庚日에 英陽人 金秉鉉이 작성하였다. 김병현은 지역 출신의 유학자로 본 자료에 말미에 수록된 任司錄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김병현은 앞서 1939년에 편찬된 『新寧鄕案』의 序文을 작성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1939년의 『新寧鄕案』는 1597년부터 1938년까지 舊 新寧縣 지역에서 작성되었던 역대 座目을 모두 수록한 것으로, 본 향안은 1939년 향안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실제 1939년 향안에 수록된 다수의 인물이 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김병현이 작성한 서문에서는 1951년에 향안이 작성되는 연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향안 작성의 배경이 6.25 전쟁임이 확인된다. 전쟁으로 혼란했던 시기 향중의 유림들이 聖廟의 享祀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는데, 이는 모두 秉彛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니, 다른 고을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物資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權寧滿은 향안이 가장 중요한 役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에 여러 인사들이 권영만의 의견에 뜻을 모으게 되었고, 그 결과 향안을 편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향안의 役을 주장한 권영만 역시 김병현과 마찬가지로 任司錄과 1939년의 향안에서 확인되는 인물이다. 전쟁 중에도 향촌 교화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향안이 편찬된 것이다.
規例는 모두 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향안 작성과 관련된 것 보다는 향교의 부흥을 다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첫 번째 조항에서는 世俗이 갈수록 무너져 文廟가 廢해지려고 하니, 문묘 유지를 위해 힘쓸 것이며 일차적으로 재력을 모아야 함을 강조해 놓았다. 두 번째 조항은 향안을 새롭게 엮으며 先後次序를 정하는 것은 誠意의 多少로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다만 그 공이 비슷하면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 번째 조항은 역시 향교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모두가 향교에서 열리는 享祀와 會席에 성심성의껏 참여하여 스스로 수양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1951년 향안 편찬이 향촌 교화기구로서의 향교 부흥과 관련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凡例는 7개조로 향안 편찬의 원칙을 제시해 놓았다. 첫 번째 조항에서는 본 향교에 불행히 財源이 蕩竭된 상황에서 고을의 9姓 11門中이 힘을 모으게 되었으나, 향교 유지에는 부족하기에 百幾十 문중이 힘을 모아 우선 향안을 만들게 되었으니, 부득이 빠진 문중은 용서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새롭게 향안을 작성함으로써 향교 부흥의 참여 문중을 늘여,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두 번째 조항부터는 향안 구성을 언급해 놓았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각 문중이 단자를 올리면 그 단자에 의거하여 入鄕祖를 기재한 후, 이어서 實蹟, 해당 子孫, 本支를 기재했다고 한다. 세 번째 조항에서는 洞도 함께 기재하는 데 ‘某氏某洞門中’의 형식으로 한다고 했으며, 네 번째 조항에서는 次序는 문묘 유지를 위한 의연금의 출연이 많은 가문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섯 번째 조항에서는 각 문중별 좌목은 冑孫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후손을 나이순대로 기재하는 형식을 취함을 밝혀 놓았다. 여섯 번째 조항에서는 舊鄕 9姓 11門中의 篇次는 옛 향안의 순서대로 작성한다고 하였다. 이 옛 향안은 바로 1939년에 작성된 舊 『新寧鄕案』이다. 마지막 조항에서는 ‘某姓某洞’만 기입하고 本支를 드러내지 않거나 단자를 올리지 않은 것은 다만 ‘維持會員’이라고만 별도로 기재한다고 해 놓았다.
본문은 凡例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9姓 11門中을 중심으로 가급적 향교 부흥에 의연금을 많이 출연한 문중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1951년 당시 향교 운영에 영향력이 높던 문중의 순서대로 좌목이 구성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본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거주하는 동리나 계보가 다를 경우 다른 좌목에 기재해 놓았다. 명단은 성명, 字, 출생 간지, 입향조와의 代數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좌목에서 확인되는 문중은 모두 163문중이다. 이중 本支를 밝히지 않았거나 단자를 올리지 않고 출연만 한 維持會員은 30문중에 달한다. 좌목에 입록된 인원은 708명이며, 姓貫은 64개 姓貫이다. 좌목에 수록된 인원으로만 입록 성관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慶州李氏 61명(15개 문중, 1개 維持會員), 慶州金氏 37명(8개 문중, 1개 維持會員), 安東權氏 36명(10개 문중, 7개 維持會員), 羅州丁氏 36명(6개 문중), 義城金氏 33명(6개 문중), 昌寧曺氏 32명(5개 문중, 3개 維持會員), 仁同張氏 31명(1개 문중), 月城孫氏 28명(4개 문중, 2개 維持會員), 昌寧成氏 25명(2개 문중), 英陽金氏 25명(1개 문중), 咸安趙氏 25명(5개 문중), 淸州韓氏 22명(3개 문중), 金海金氏 22명(6개 문중, 2개 維持會員), 陽山李氏 20명(2개 문중), 坡平尹氏 19명(3개 문중), 南平文氏 17명(2개 문중), 順興安氏 17명(2개 문중), 密陽朴氏 16명(5개 문중), 東萊鄭氏 16명(3개 문중), 秋溪秋氏 13명(3개 문중), 星州李氏 12명(2개 문중), 醴泉林氏 12명(5개 문중), 龜山朴氏 11명(2개 문중), 金寧金氏 11명(4개 문중, 1개 維持會員), 月城朴氏 10명(2개 문중), 順天朴氏 9명(1개 문중), 淸州韓氏 8명(4개 문중, 2개 維持會員), 慶州崔氏 8명(3개 문중), 全州李氏(3개 문중, 1개 維持會員), 星州裵氏 7명(2개 문중), 高靈金氏 7명(3개 문중), 廣州盧氏 7명(1개 문중), 安東金氏 6명(3개 문중), 濟州高氏 6명(1개 문중), 延日鄭氏 6명(3개 문중, 1개 維持會員), 晋州河氏 5명(1개 문중), 星州都氏 4명(1개 문중), 廣州金氏 4명(1개 문중), 平山申氏 3명(2개 문중, 1개 維持會員), 平海黃氏 3명(2개 문중), 長興高氏 3명(1개 문중), 尙州周氏 3명(1개 문중), 壽城羅氏 3명(1개 문중), 驪州李氏 2명(3개 문중, 1개 維持會員), 淸道金氏 2명(2개 문중, 1개 維持會員), 晋州姜氏 2명(2개 문중, 1개 維持會員), 興陽李氏 2명(1개 문중), 光山金氏 2명(1개 문중), 玉山全氏 1명(2개 문중, 1개 維持會員) 순이며, 나머지 淸州鄭氏, 牙山蔣氏, 文化柳氏, 眞城李氏, 玄風郭氏, 永川皇甫氏, 杞溪兪氏, 仁川蔡氏, 祥原金氏, 達城徐氏, 金海許氏는 1개 문중에서 1명만 참여하였다. 나머지 永川李氏, 延安李氏, 全州崔氏, 綾城具氏는 입록자 없이 維持會員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소수의 입록자를 배출하거나 維持會員으로 참여한 가문의 경우 입록 시기가 대부분 19세기 이후로, 이른바 新鄕이다. 또한 이러한 가문 중에서는 입향조가 본 향안 작성 당시 생존했던 인물도 확인된다.
마지막 任司錄은 鄕校에서 활동하던 舊 新寧縣 유림들이 본 향안을 작성할 때, 구성되었던 임원 명단이이다. 이에 따르면 총괄 책임자로 보여 지는 都廳 3명을 비롯하여, 都監 4명, 校正 3명, 校正有司 3명, 編輯 3명, 編輯有司 3명, 正單 3명, 收單有司 3명, 寫本 3명, 監印 3명, 總務 4명, 內務 11명이 나타나는데, 모두 본 향안의 좌목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까지 유림들의 향촌자치기구와 교육 및 교화 기구로 운영되던 향청과 향교가 20세기 이후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원래 향안은 유향소 鄕員의 명단을 수록한 것으로써, 향촌지배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51년 향교에서 활동하던 유림이 주축이 되어 편찬한 본 향안은 전통적인 성격과는 관계가 없다. 지역 사회의 주요 가문들 간에 결속력 강화와 향안 작성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특히 후손들은 향안 작성을 통해 자신들이 전통적인 사족 가문임을 표방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본 자료에는 舊 新寧縣 지역에 거주했던 사족 가문이 해당 동리와 姓貫, 그리고 入鄕祖 별로 망라되어 있어, 조선후기 이 지역 사족 가문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