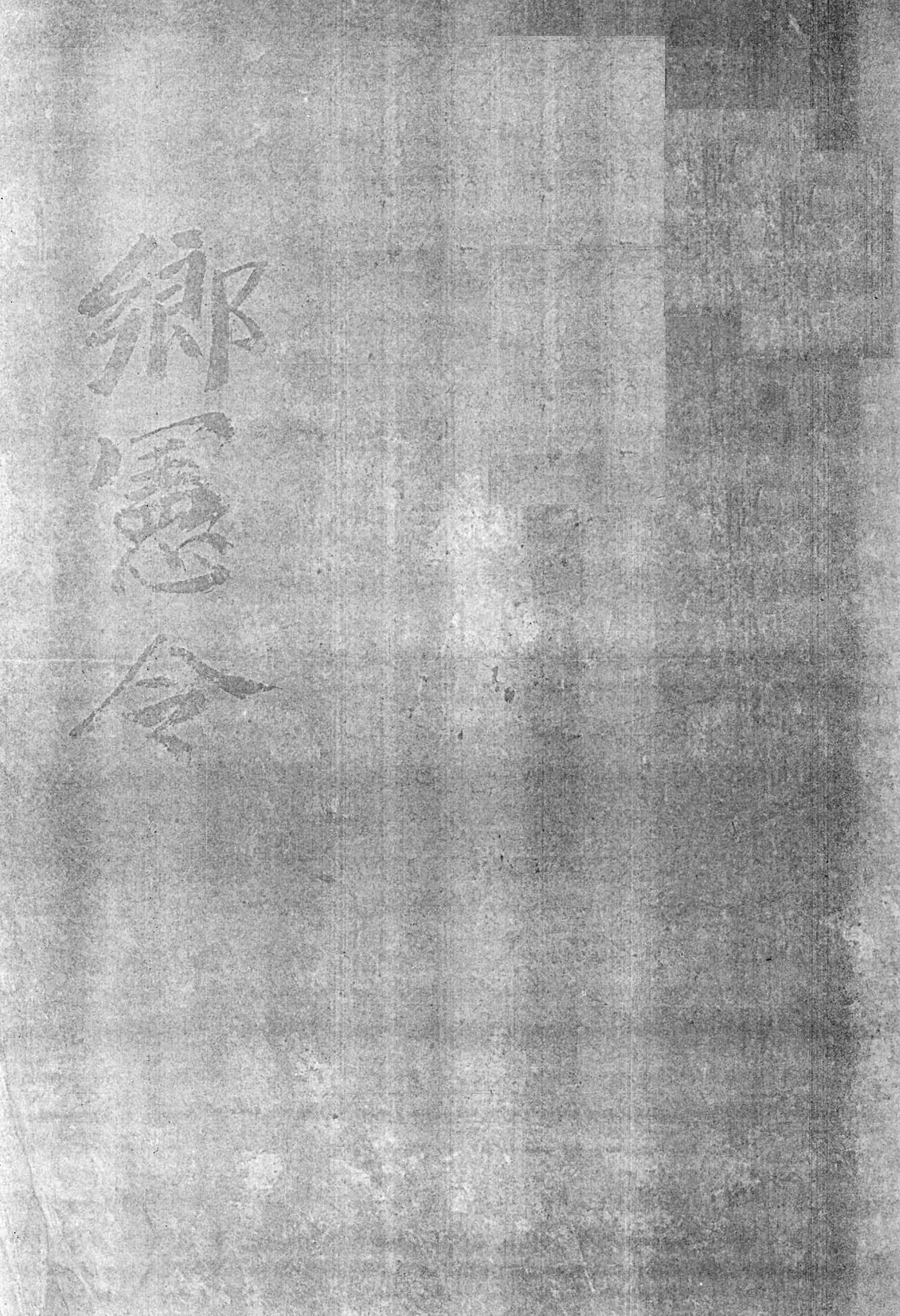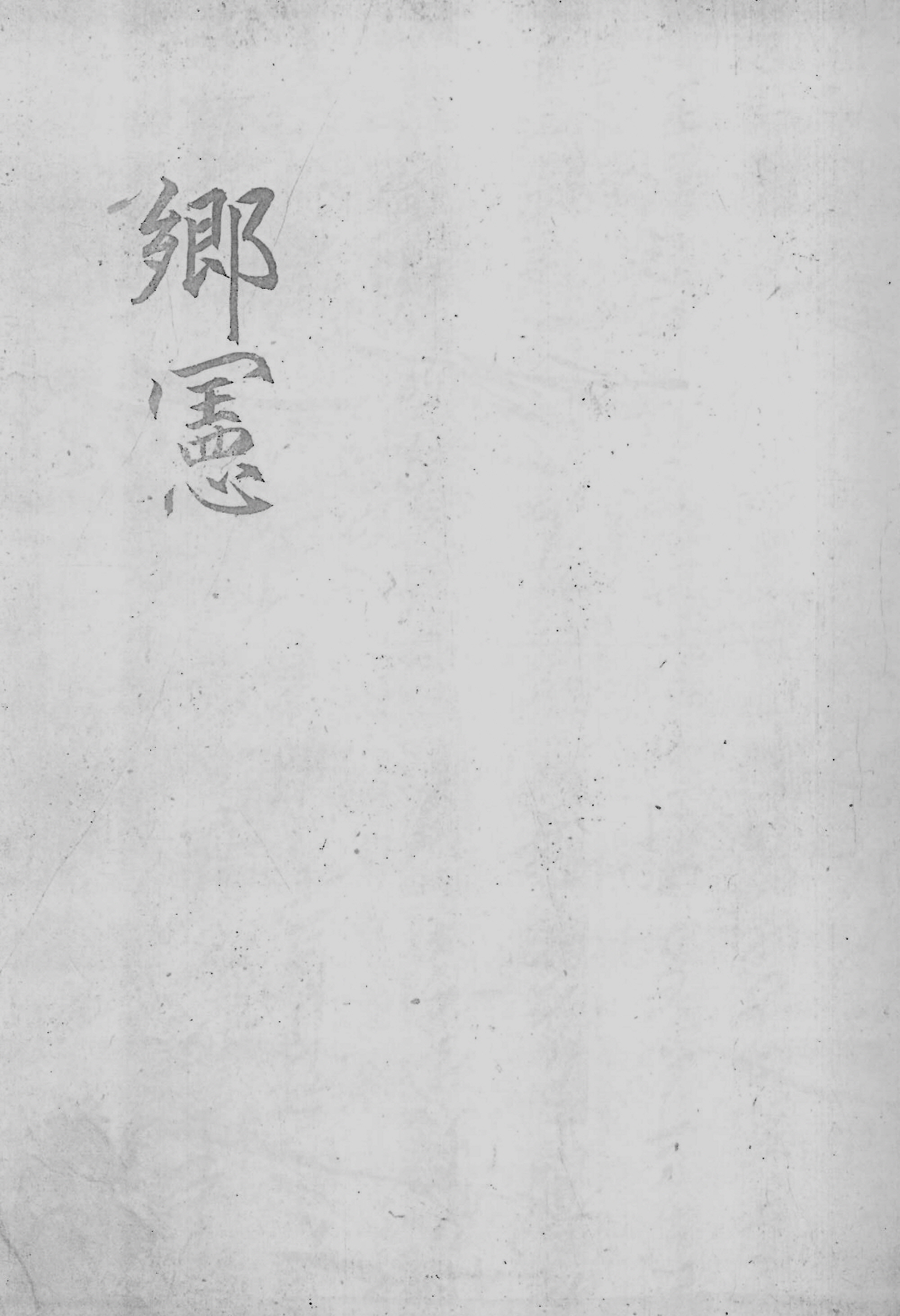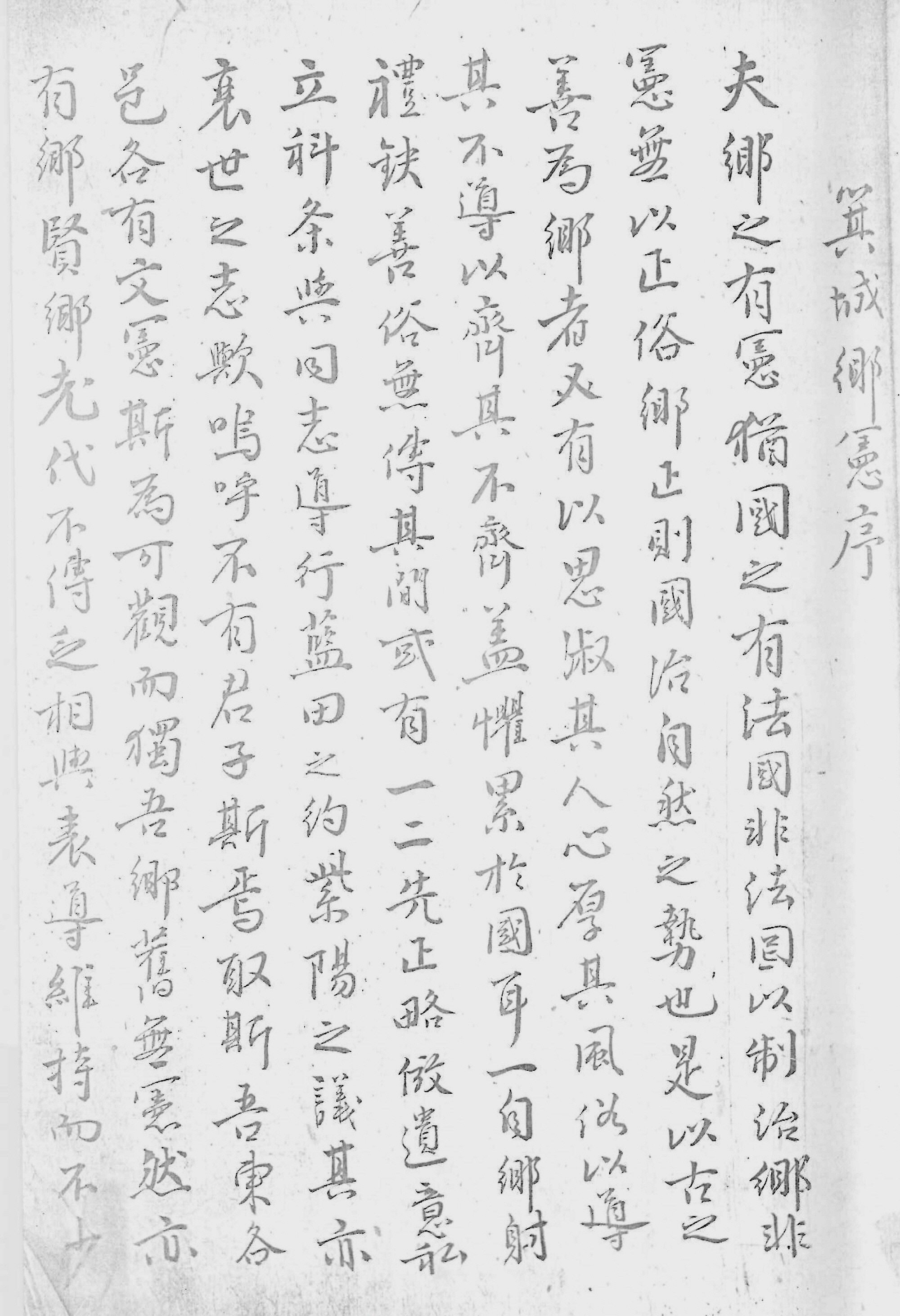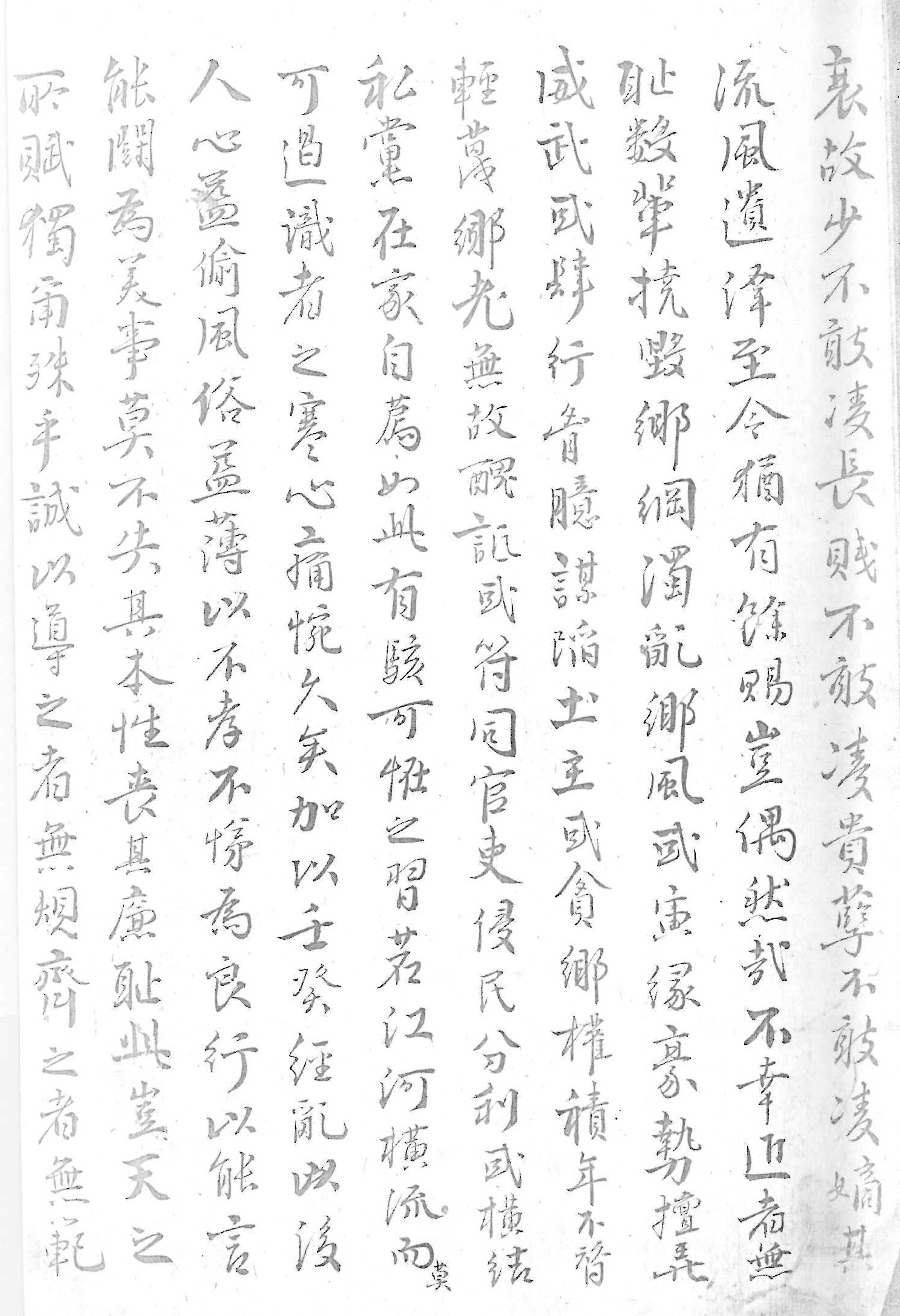[내용 및 특징]
18세기 江原道 平海郡(지금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병합)에서 실시되었던 鄕憲令이다. 鄕憲令 또는 鄕憲은 평해군의 留鄕所(후일의 鄕廳) 운영 및 구성원의 통제와 관련하여 제정된 제 규정을 뜻한다. 이러한 자치 규정은 16세기 이래 朱子增損呂氏鄕約과 접목되어 향약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평해군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향약도 17세기 전후해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본 향헌은 이러한 향약의 전통을 계승하여 1752년 평해군 鄕廳에서 엮은 것이다. 표지에는 ‘鄕憲令’, 속표지에는 ‘鄕憲’이란 제목이 붙여져 있으며, 본문은 黃應淸(1524~1605)의 序文인 「箕城鄕憲序」, 憲令 12조, 罰令 29조, 張蘊의 誌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헌령 12조와 벌령 29조는 황응청이 향헌을 제정할 때의 규약으로 여겨진다.
가장 서두에 수록된 「기성향헌서」는 황응청의 문집인 『大海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한창 향약이 보급되던 17세기 전후, 箕城(平海의 別稱) 출신의 문신 황응청이 향헌을 평해군에서 제정하면서 작성한 서문이기에 본 자료 가장 서두에 수록된 듯하다. 서문에는 향헌 제정의 경위와 의의가 언급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먼저 고을에서의 憲이 나라의 法과 동일한 것이기에, 예전부터 고을에서 자치적으로 개도하는 바가 있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鄕射禮가 중단되고 善俗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풍속이 해이해지고 말았기에, 한 두 先正이 ‘藍田之約(北宋의 呂氏鄕約)’, ‘紫陽之議(南宋 朱子의 增損呂氏鄕約)’와 같은 약속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각 고을에서도 이 뜻을 계승하여 규범을 만들게 되었는데, 비록 평해군에서는 이상의 규정은 없었지만 鄕賢과 鄕老가 있어 교화가 이루어졌었음을 자부하였다. 하지만 근래 몇몇 무리가 고을의 기강을 해치고 있고, 힘을 믿고 농단을 자행하고, 土主를 모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였다. 그래서 1592~1598년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인심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鄕老들에게 물어 제 규정인 鄕憲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밝혀 놓았다.
서문 다음의 憲令은 모두 12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4개조에서는 대략 ‘一, 품행이 독실하여 한 집안의 행실에 孝悌가 있는 자’, ‘一, 마음을 쓰는 것이 풍요로워 친족과 화목하고 이웃을 구휼하는 자’, ‘一, 제사를 정성스레 지내고 喪을 잘 치러 後進을 훈도하는 자’, ‘一, 官事를 잘 다스리고, 長上을 공경하며, 교제를 두텁게 하는 자’를 규정해 놓고, 이상은 鄕所에서 널리 의논한 뒤, 순서대로 襃獎을 論報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음 8개조는 유향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으로, 그 대략은 ‘一, 옛 수령이 관직을 그만두고 교체할 때 앞서 위무하고 전송하는데 아낌이 없을 것’, ‘一, 향중 大父老로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자가 상을 당하면 제물을 갖추어서 致奠할 것’, ‘一, 매년 봄과 가을에 講信을 행하는데, 혹 官鄕에 큰 변고가 있으면 曹司가 향소에 알리고 文老들이 논의하여 다른 날에 設行할 것’, ‘一, 유향소의 三員은 鄕望을 쫓아 뽑은 뒤 관에 보고하여 맡기고, 각기 2년을 한도로 서로 교체할 것’, ‘一, 유향소의 향임직을 교체할 때에는 公備雜物을 일일이 살피고 謄書해서 인수인계 할 것’, ‘一, 유향소의 좌목을 흐지부지 잃어버리고 향헌을 함부로 고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참여시키지 말 것’, ‘一, 鄕錄은 반드시 三參을 갖추어서 圈點하여 쓰되 先後를 논하지 말고 쓸 것’, ‘一, 품관의 자제인 자로 장사에 힘쓰는 자는 비록 좌목에 있더라도 향임으로 임명하지 말 것이며, 행동거지가 麤悖한 자 또한 鄕錄에 허용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는 유향소 좌목에 입록될 수 있는 사족의 자격으로 三參을 규정해 놓고 있음이 주목된다. 三參은 부계와 모계, 그리고 처향에 신분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로, 사족 중심의 폐쇄적인 유향소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이다.
헌령 다음의 罰令은 29조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4개조는 인륜이나 강상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자들로 모두 極罰로 다스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청에 알린 뒤 처단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은 20개조는 향임 수행시의 비리, 損徒된 향원의 행실, 풍속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처벌 수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략적으로 나열하면 향임 교체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公備를 남용하면 극벌, 향임을 청탁하고 추천 때 갈등을 일으키면 극벌, 향임으로 비리를 많이 저지른 자는 임기를 채워도 上罰, 유향소 望報 때 향론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속단하는 자는 극벌, 새 品官을 圈點할 때 相避하지 않거나 공론을 따르지 않으며 사심에 의해 청탁하는 자는 극벌, 6촌 이내에 향리의 잡류와 통혼하면 극벌, 품관으로 관아에 출입하며 향론의 시비를 따지거나 향소를 헐뜯는 자는 극벌, 損徒된 품관이 公會에 참석하면 中罰, 품관으로 아무까닭 없이 관부에 출입하면 下罰, 1개월 손도된 자로 기한이 지났음에도 손도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손도 기한을 정함, 永永 손도된 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극벌, 영영 손도된 자가 마음으로 뉘우치면 상벌로 처리하고 1년 또는 1개월 손도된 자는 각각 中令과 下令으로 처리, 품관과 관리가 한 통속이 되어 관리와 부호집에 출입하면 상령, 元惡鄕吏와 민가에 작폐를 저지르는 자, 그리고 私賤을 첩으로 맞아들이거나 서얼이 사족이 모욕하면 중벌, 正妻를 소박하면 상령,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실례를 저지르면 하벌, 유향소 천거 때 상피하지 않으면 하령, 新參禮의 기한이 지나도 행하지 않으면 하령, 공회에 까닭 없이 한 번 불참하면 1개월 손도, 두 번 불참하면 1년 손도, 세 번 불참하면 영영 손도이다. 이어 벌령 말미의 4개조에는 극벌, 상벌, 중벌, 하벌, 상령, 중령, 하령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수록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극벌은 出鄕, 상벌은 영원히 손도, 중벌은 1년 손도, 하벌은 1개월 손도이다. 그리고 상령은 酒 15盆, 중령은 酒 7盆, 하령은 酒 5분으로 술을 내놓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자료 가장 마지막에 수록된 장온의 誌는 1752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평해군에서 향헌령이 새롭게 엮여진 사유를 언급해 놓았다. 우선 장온은 젊었던 시절 향청에서 향임들이 향헌을 열람하는 것을 보았으니 바로 옛적 황응청이 작성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고장의 풍속이 바로 잡히게 되었고 평해군이 비록 작은 고을이나 인근 대읍들도 감히 무시하지 못했음을 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46년 4월 밤 향사당에 화재가 나 향헌을 비롯한 많은 문서들이 전소하게 되어 많은 인사들이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다행히 인근 蔚珍 고을의 인사들이 일찍이 황응청이 제정한 향헌을 베껴 자신들의 고을에서 실시하고 있었기에, 고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울진의 향헌을 다시 베껴 예전의 향헌을 복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새롭게 엮여진 향헌을 하나는 櫃에 보관하고, 하나는 건물에 현판으로 걸어 놓았음을 밝히고 있다.
자료 말미에는 당시 향임 3명의 성명을 기재해 놓았는데, 座首는 安大用, 別監은 張世翰과 安尙明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유향소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는 비록 1752년에 엮여진 것이라 하나, 마지막 장온의 誌를 제외하고는 17세기 전후에 작성되었던 것들이다. 즉 임진왜란 이후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유향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유향소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재지사족 중심의 배타적 운영이다. 즉 지역의 전통적인 재지사족을 제외한 다른 신분의 참여를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자신들 주도의 향촌지배질서를 도모하였는데, 평해군의 향헌에도 이러한 규정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헌령에 三參을 규정해 놓은 것은 배타적 운영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이다. 罰令에서도 6촌 이내에 잡류와 혼인할 경우 향벌로 다스리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 배타적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황응청이 제정한 벌령의 경우 다른 향헌이나 향약류와 비교하여 매우 다양한 처벌 규정이 확인된다. 죄질의 크고 작음에 따라 極罰, 上罰, 中罰, 下罰로 구분하는 것은 退溪의 학통을 계승한 지역에서 흔히 확인되는 벌령이나, 이와는 별도로 유향소에 술을 내어 죄질을 갚는 上令, 中令, 下令의 규정은 매우 특색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