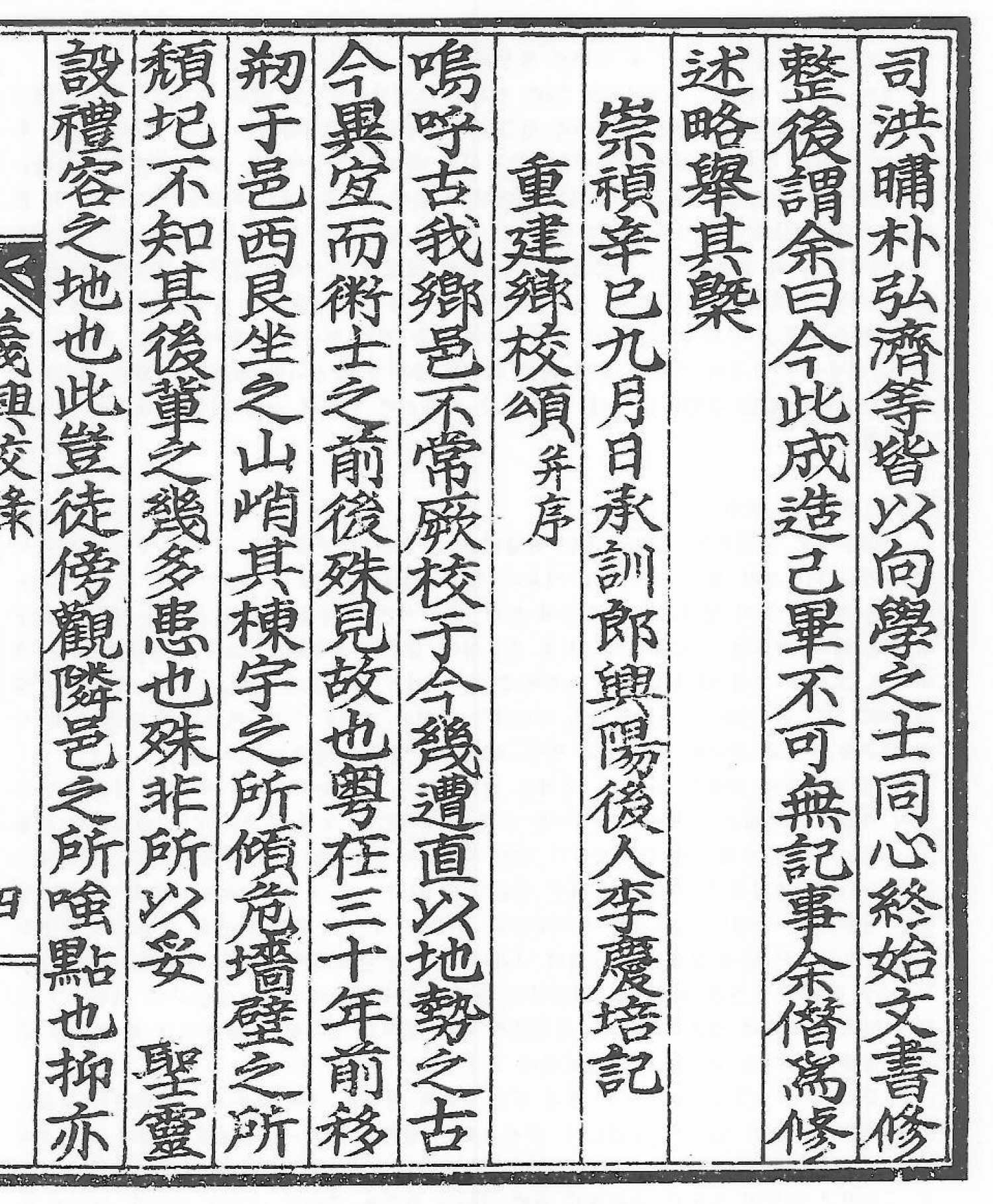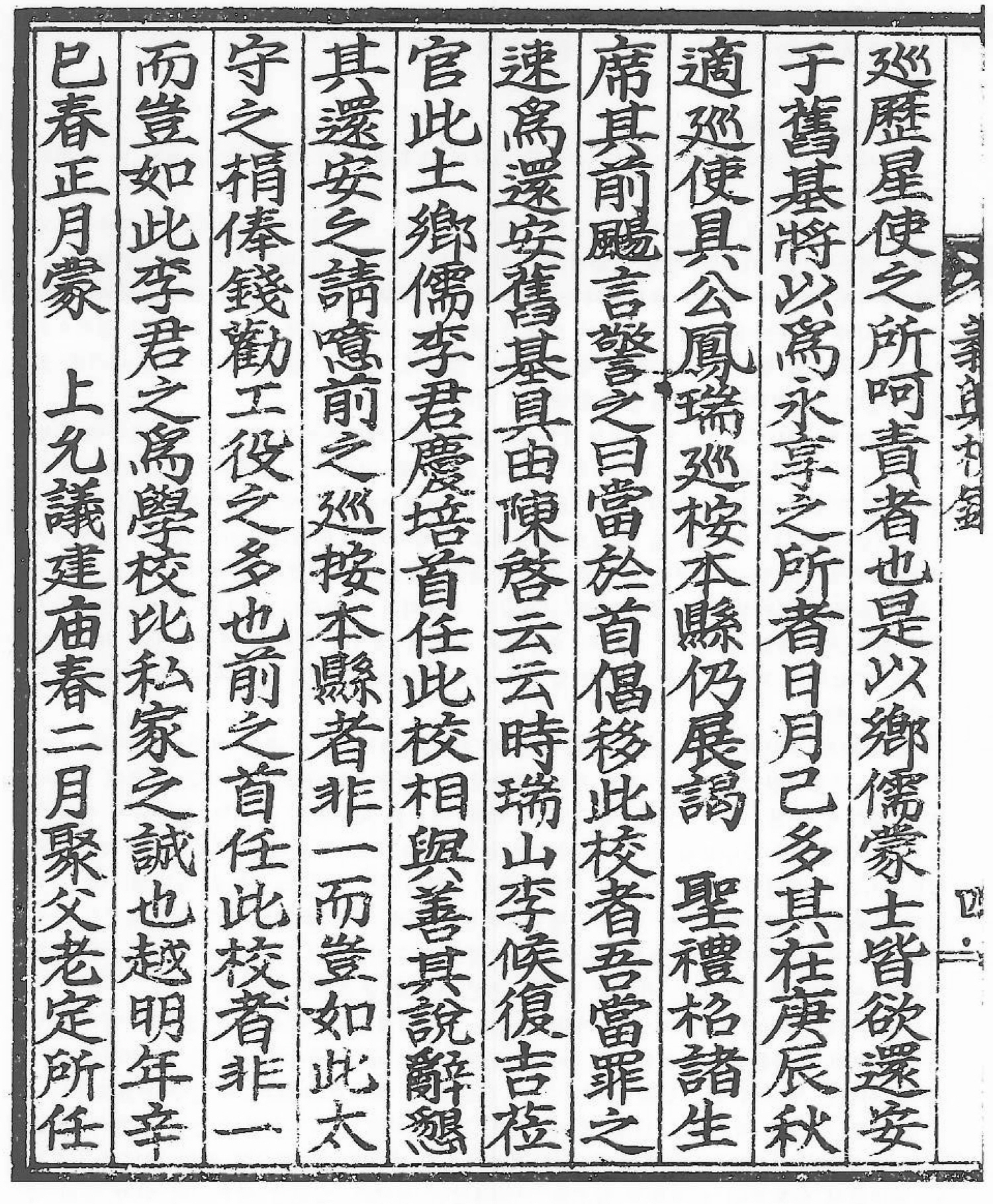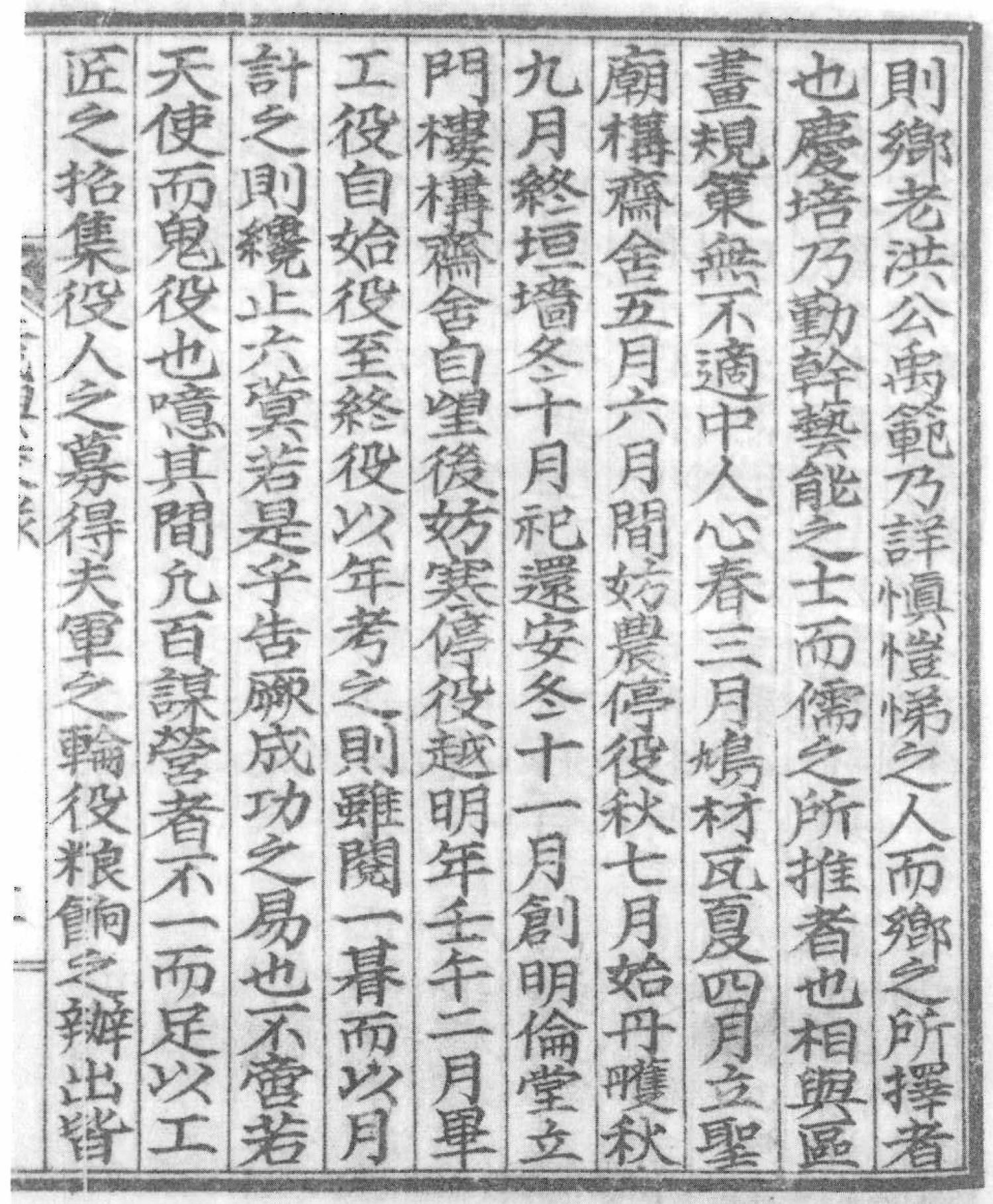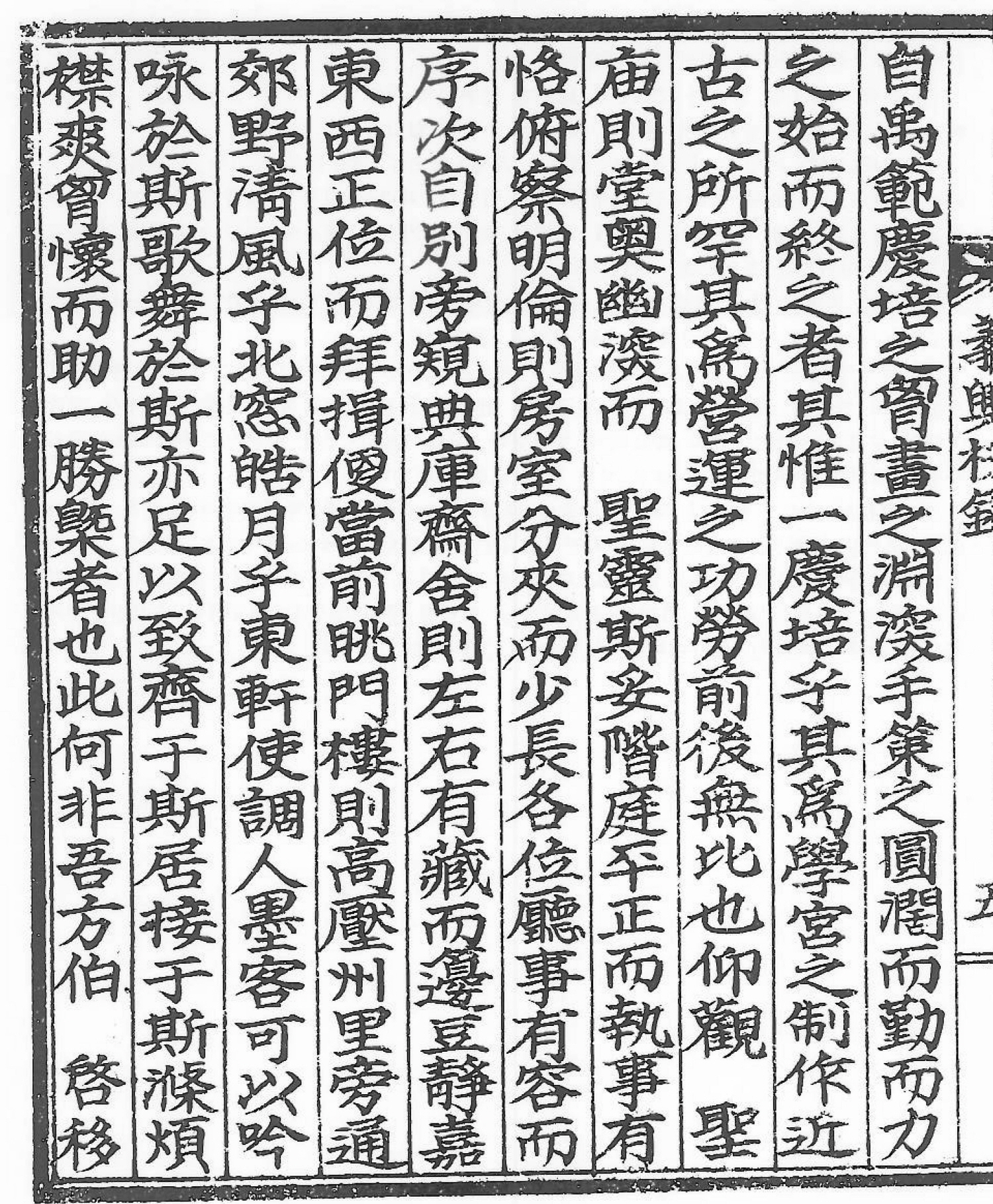1642년 慶尙道 義興縣의 義興鄕校의 重建이 끝난 후 중건의 경위와 의의를 노래한 洪昕의 頌과 序文으로 1935년 간행된 『義興校錄』에 수록
[내용 및 특징]
1642년 10월 上浣에 慶尙道 義興縣 출신의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洪昕이 지은 頌과 序文이다. 1641년 시작된 義興鄕校의 이건 공사가 이듬해인 1642년 마무리되자 공사 경위와 관련 인사들의 노고를 칭송하며 지은 것이다. 해당 頌과 序文은 1935년 의흥향교에서 간행한 『義興校錄』에 「重建鄕校頌幷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홍흔 역시 의흥향교 운영에 간여했던 인물로 『義興校錄』에 수록된 역대 의흥향교 校任 명단인 「校任相遞錄」에 따르면, 1636년 2월과 1638년 2월에 의흥향교 副任인 掌議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重建鄕校頌幷序」는 먼저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문에 나타나 있는 의흥향교 중건 경위와 관련 인사들의 공적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옛 우리 고을에 향교가 항상 제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은 몇 번이나 地勢에 대하여 古今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前後의 術士, 즉 풍수를 보는 사람의 견해가 같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30년 전 邑의 서쪽 艮坐의 가파른 산에다가 향교를 옮겨지었는데, 棟宇는 기울 듯이 위태로웠고 담장은 무너져 쓰러질 듯했으니, 이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을 겪게 될지 모르고 저지른 조치였다. 그곳은 절대 聖靈을 안위케 하고, 禮容을 베풀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이웃한 고을 사람들이 비웃으며 손가락질 했으며, 또한 巡歷하던 星使, 즉 巡察使가 꾸짖어 책망하였다. 이로써 鄕儒와 蒙士가 모두 옛 터에 還安하여, 장차 그곳에서 영원히 享祀를 지내고 싶은 염원을 가지게 되었다. 마침 지난 1640년 가을 순찰사 具鳳瑞가 本顯을 살펴보실 때 향교에서 謁聖禮를 행한 뒤 諸生들 앞에서 향교를 이전에 옮긴 것은 당연히 우리 고을 사람들의 죄임을 큰 소리로 경계하였고, 이어 還安하는 것으로 陳啓할 것을 말하였다. 이때 義興縣監으로 있던 李復吉과 향교의 首任, 즉 都有司를 맡은 적이 있는 鄕儒 李慶培가 간절하게 還安의 당위성을 간청하였었다. 이전에 우리 고을에 임명되었던 수령과 巡歷했던 순찰사 가운데 지금의 수령처럼 공사를 위해 자신의 녹봉을 내어줄 만큼 관심을 보인 이가 없었으며, 이전에 향교의 首任들 가운데 이경배처럼 자신 집안의 일을 다스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한 이도 없었다. 이에 이듬해인 1641년 봄 正月 建廟를 허락하는 임금의 윤허를 받게 되었다. 봄 2월에는 父老를 모아두고 所任을 정하였는데, 고을의 원로들은 洪禹範이 신중하며 화평하고 단아하기에 그를 택하였다. 또 이경배는 부지런하고 재주 있는 선비로서 유생들이 추천한 자이다. 둘이 서로 갖가지 방책을 모색하니 고을 사람들의 人心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봄 3월 기와를 만들 자금을 모으고, 여름 4월에는 聖廟를 세우고 齋舍를 지었으며, 5월과 6월에는 농번기여서 공사를 중지하였다. 7월에는 단청을 칠하였고, 가을 9월에는 담장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겨울 10월에는 還安하고 제례를 올렸다. 겨울 11월 明倫堂을 짓고 門樓와 齋舍를 세우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보름 이후에는 날씨가 추워 중지하고, 이듬해 2월에 공사를 끝내게 되었다.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年考해보면, 비록 해로는 1년이 걸렸지만 달로는 겨우 6개월 만에 이룬 것이니, 그 성공의 이룸을 고하매 하늘이 귀신을 부려 공사를 마친 것과 같았다. 그 간에 무릇 백가지로 모의하여 經營한자가 한둘이 아니나, 工匠을 불러 모은 것, 役人을 모집한 것, 夫軍을 돌려가며 일을 시킨 것, 糧餉을 辦出한 것은 모두 홍우범과 이경배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좋은 방책과 근면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힘쓴 이로는 이경배가 유일하다. 향교의 제도를 위한 그의 업적은 近古에 드문 것이며, 營運의 공로를 전후에 비교할 만한 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聖廟를 우러러 살펴보니 堂奧는 깊숙하고 고요하여 聖靈이 편안할 수 있으며, 계단과 뜰은 평평하고 반듯하여 執事의 삼감이 있을 만하다. 이어 아래로 명륜당을 살펴보니 房室이 나뉘어져 있어 젊은이와 어른 간에 위계가 있는 것과 같으며, 廳事에는 모양새가 있어 序次가 저절로 구분이 된다. 또한 典庫와 齋舍를 얼핏 보니, 좌우에 저장할 곳을 갖추어 籩豆가 정결하게 놓여 있으며, 東西로 正位해 있음은 拜位하는 데 알맞다. 앞의 門樓를 보니 州里를 높이서 눌러 넓은 들판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北窓으로 맑은 바람이 불고 東軒에는 밝은 달이 뜨니, 墨客으로 하여금 가히 이곳에서 시를 짓고 歌舞를 즐기게 하며, 또한 족히 이곳에서 致齊하고 居接할 만하다. 이러한 것이 어찌 우리 方伯이 移安의 啓를 올린 것, 太守께서 항교를 흥하게 한 것, 그리고 우리 宗叔, 즉 홍우범이 都監을 맡은 것, 이경배가 모든 일을 총괄하여 일을 두루 살펴 깊은 계책을 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후에 本縣을 巡安하는 자가 있어서 이를 본다면, 전에 우리 方伯이 移安을 하자고 啓를 올린 것, 우리 고을에 부임하신 수령께서 녹봉을 내어 공사를 도와 준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首任이 학교를 위한 일을 자신의 집안일을 돌보는 것과 같이 한 것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에 큰 공이 있는 순찰사 구봉서, 의흥현감 이복길, 홍우범과 이경배의 공적을 泯滅됨이 없이 후대에 알리고자 하는 까닭에 이경배의 誌 다음에 이 서문을 쓰게 되었다.
위의 서문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이경배는 의흥현 출신의 유생으로 중건 공사를 주도했으며, 의흥향교의 首任인 都有司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본 공사를 주도했던 관계로 역시 중건 경위와 의의를 언급한 「鄕校移創節目記」를 작성하였었다. 서문 말미에 말한 이경배의 誌가 「鄕校移創節目記」로 추정되는데, 「重建鄕校頌幷序」와 함께 『義興校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경배의 기문에는 본 서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읍의 서쪽으로 처음 향교를 移建하기 전의 상황과 공사를 주도한 주요 인사들의 행적이 좀 더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아울러 본 자료 다음에는 역시 有司로 중건에 참여했던 朴俒의 「附重刱記後」가 수록되어 있어 앞의 자료와 함께 중건 경위와 그 과정을 살펴 보는 데 참고가 된다. 서문 다음에는 중건 공사의 공적을 칭송한 頌을 수록해 놓았다. 서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건의 경위와 순찰사 구봉서, 의흥현감 이복길, 그리고 홍우범과 이경배의 공적을 칭송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홍흔의 서문과 頌은 의흥향교 관련 자료가 대부분 逸失된 상태에서, 이경배가 지은 「鄕校移創節目記」와 더불어 의흥향교의 연혁을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서문과 頌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풍수에 따라 의흥향교의 위치가 거듭 옮겨졌다는 사실로, 17세기 초반 풍수에 대한 인식을 단편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1935년에 慶尙北道 軍威郡 소재 義興鄕校에서 간행한 『義興校錄』 卷之一의 四에서 七까지 「重建鄕校頌幷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義興校錄』, 義興鄕校, 1995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軍威마을誌』, 대구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군위군청, 군위문화원, 2007
이광우,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