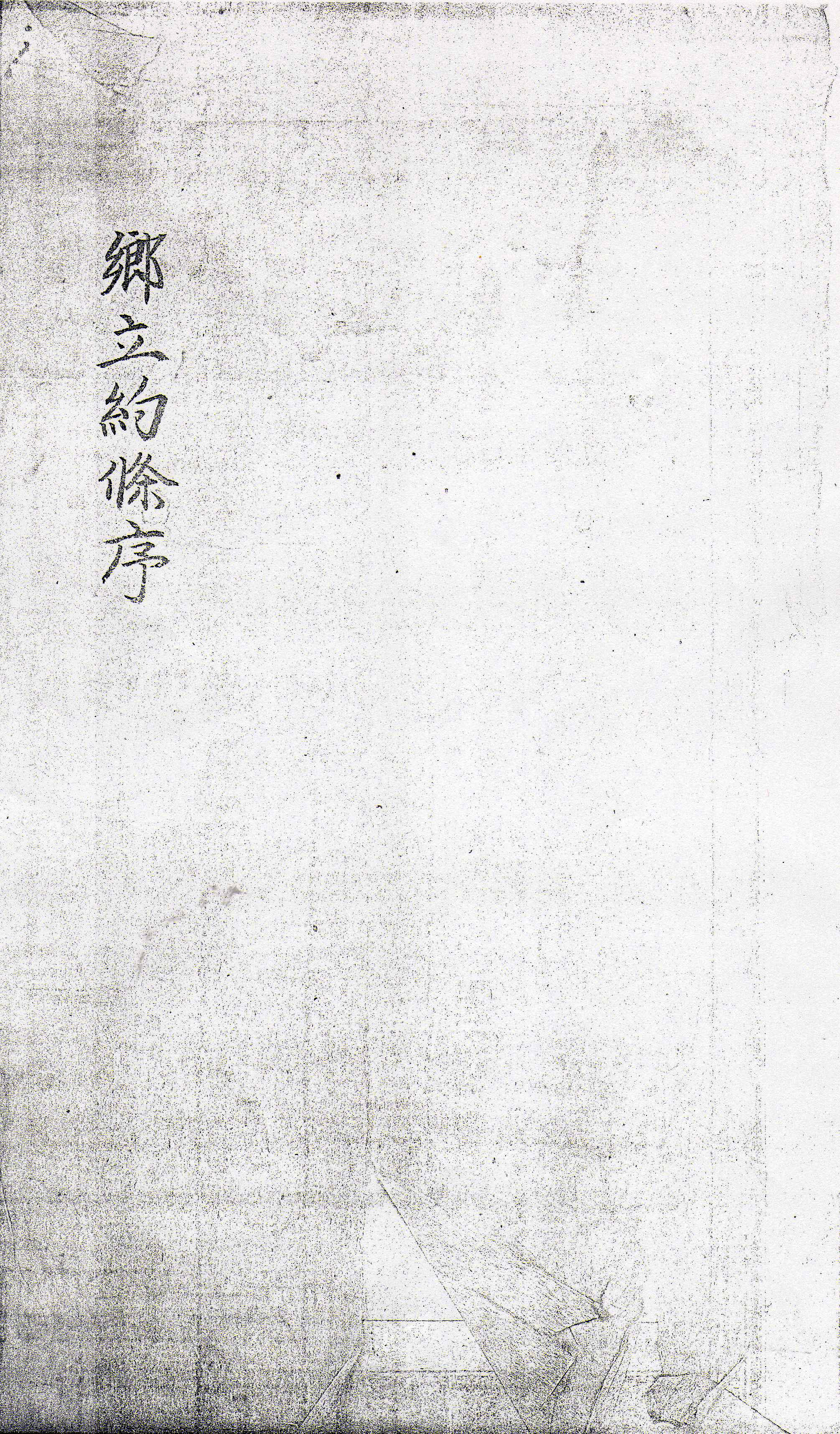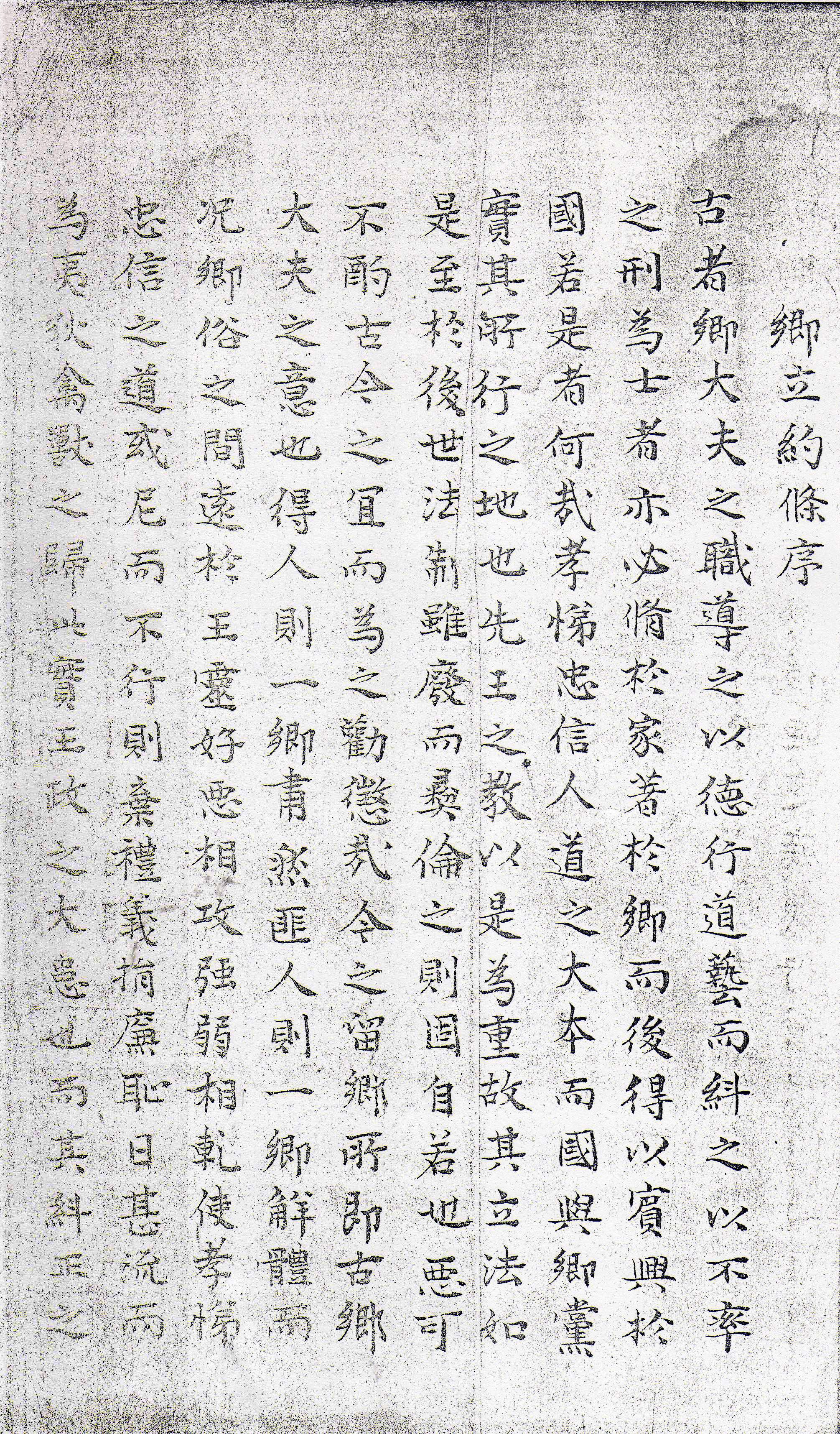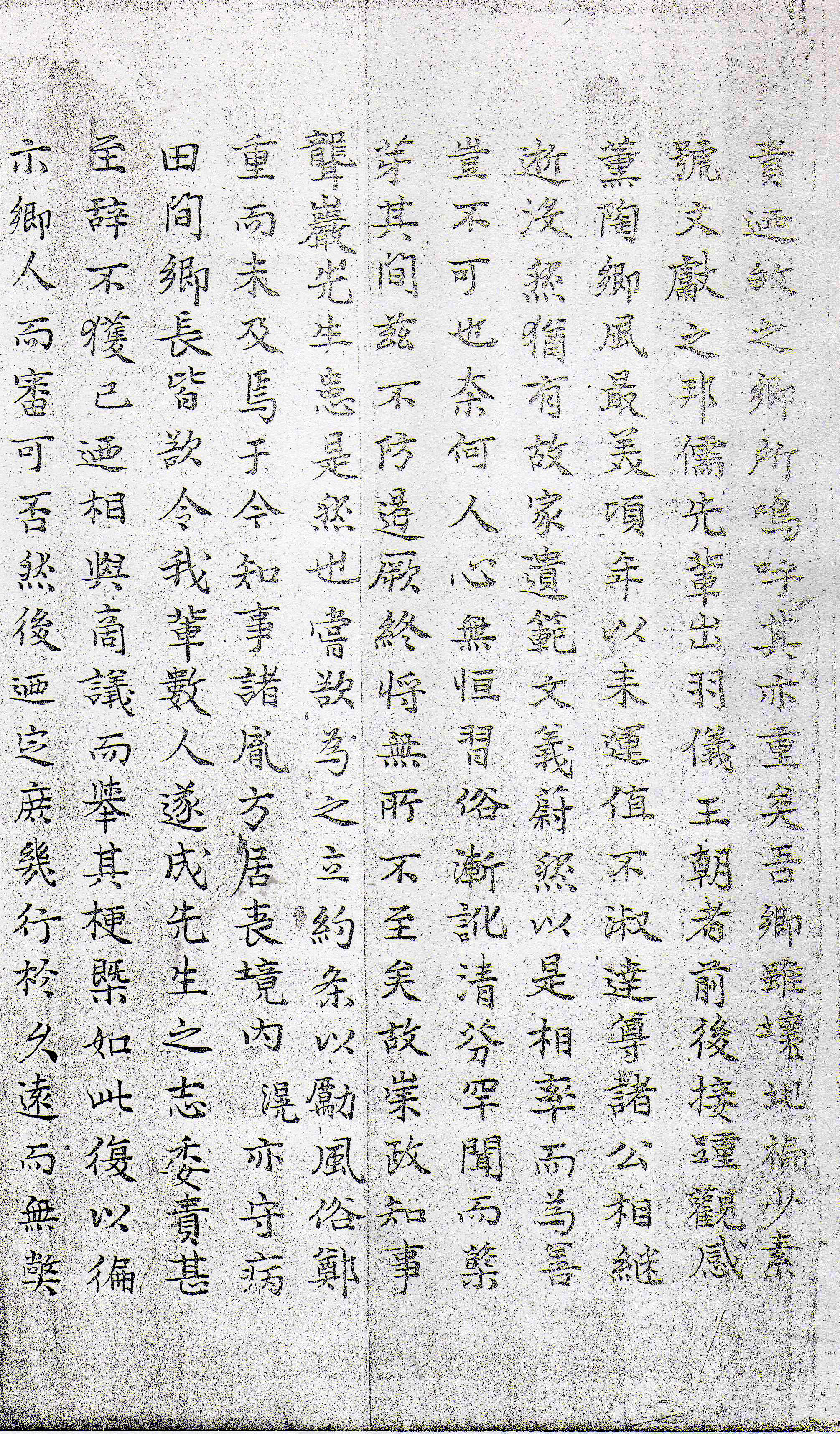[내용 및 특징]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에 鄕約을 보급함으로써, 향약의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바탕으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嶺南 지역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향약으로는 退溪鄕約이 있다. 이 향약은 1556년 退溪가 고향인 禮安 고을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퇴계와 그의 門人들은 이후 朱子增損呂氏鄕約과 퇴계향약을 典範으로 삼아 영남 각 고을로 향약을 보급해 나갔다. 특히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金圻는 사족뿐만 아니라 하층민까지 통제하는 ‘下人約條’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慶尙道善山府에서도 退溪鄕約과 金圻鄕約을 典範으로 향약이 제정되었었다. 현재 善山鄕校에는 향약 시행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 자료는 퇴계향약과 김기향약의 下人約條를 수록한 뒤, 時宜에 맞추어 몇 개 조항을 추가로 부기하고 「鄕立約條」라는 제목으로 엮어놓은 것이다.
「향입약조」의 정확한 작성 연도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자료 가장 말미에 丙辰年에 三書했으며 鄕射堂 위에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이 퇴계향약 제정연도(丙辰年, 1556)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조선후기의 병진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三書 했다는 것은 세권을 베낀 뒤 다른 고을에서 그랬던 것처럼 관청, 향사당, 향교 또는 蓮桂所에 보관했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본 「향입약조」는 향사당에 보관되었을 것이다. 「향입약조」는 鄕立約條序, 約條, 下人約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鄕立約條序는 퇴계가 1556년 향약을 제정하면서 작성한 서문이다. 「향입약조」에서는 이 서문을 그대로 옮겨 두었다. 퇴계향약은 시행된 고을의 이름을 따 禮安鄕約이라고도 하지만, 원 제목은 본 자료의 제목과 동일한 「鄕立約條」이다. 본 자료의 제목을 퇴계향약의 본래 제목과 동일하게 짓고, 그 서문을 그대로 수록했다는 것은 퇴계가 향약을 제정한 의의와 일련의 규정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鄕大夫의 임무는 德行과 道藝로 이끌고,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선비 된 자는 또한 반드시 집에서 닦고 고을에서 드러난 후에야 나라에서 賓興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孝悌와 忠信은 人道의 큰 근본이고 나라와 鄕黨은 실로 이것을 실행하는 터전이다. 先王의 가르침은 이것을 중요시한 까닭에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았다. 후세에 이르러 법과 제도가 비록 무너졌다고 하나, 彛倫의 법칙은 실로 自若하니, 어찌 古今의 마땅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勸懲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유향소는 곧 옛적 향대부의 뜻이다. 사람을 얻으면 한 고을이 숙연해지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한 고을이 해체된다. 더구나 고을의 풍속 사이에 王靈이 멀어져 좋고 나쁜 것이 서로 공격하고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삐걱거리게 되어, 孝悌와 忠信의 도리가 혹 흐려지고 행해지지 않는다면, 禮義를 버리고 염치를 잃음이 날로 심해져 시간이 지나 夷狄과 禽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실로 王政의 큰 근심이다. 그러나 이것을 규제하고 바로잡는 책임은 곧 鄕所에 있으니, 오호! 또한 무겁도다. 우리 고을은 비록 땅이 협소하나 평소 ‘文獻之邦’으로 불렸었고, 선비들이 일찍이 배출되어 王朝를 羽儀했던 자들이 전후로 뒤를 이어 나타나니 보고 느끼고 薰陶되어 풍속이 가장 아름다웠었는데, 몇 년 이래로 운이 좋지 않아 우러러 존경했던 훌륭한 여러 인사들이 잇달아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러나 오히려 故家의 남겨진 규범이 文儀가 蔚然하니, 이로써 서로 따르고 좋게 만드는 것이 어찌 불가한 일이겠는가? 어찌하여 인심에 항상 됨이 없고 습속이 점점 그릇되어, 맑은 향기가 드물게 나고 잘못된 조짐이 그 사이에 나게 되었는가? 이에 이것을 막지 않는다면 그 끝이 장차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故 崇政知事聾巖先生께서 이러한 것을 근심하여 일찍이 約條를 세워 풍속을 권장하여 鄭重하게 하려 했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지금에 知事의 여러 자손들이 바야흐로 고을 내에서 喪中에 있고, 滉은 또한 병으로 전원에 돌아와 있는데, 고을의 여러 어른들이 모두 우리 몇몇에게 선생의 뜻을 완성하기를 바라시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심히 지극하여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서로 상의하고 그 조항을 간추려 열거한 것이 이와 같았다. 다시 고을 사람에게 두루 보이고 가부를 살핀 연후에 곧 정하였으니, 아마 아득히 오랫동안 시행되어도 폐단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먼저 가르침을 세우지 않고 罰條만 들어 쓴 것을 의심하는데, 이것도 진실로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孝悌와 忠信은 타고난 떳떳한 성품에 근원하였고, 더하여 국가에서 庠序를 설립해 가르치는 것에서 權導하는 방도가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 우리 무리가 별도로 조항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孟子가 “道在邇而求諸遠 事在易而永諸難 人人親其親長其長而天下平”이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孔子의 이른바 “至德要道”이고 선왕이 인심을 착하게 한 까닭이다. 지금부터 무릇 우리 고을의 선비는 性命의 이치에 근본을 두고 국가의 가르침을 따라, 집에 있으나 고을에 있으나 각기 저 彛倫의 규칙들을 다한다면, 이것은 王國의 吉士가 될 것이다. 혹 窮하거나, 혹 達해도 서로 의뢰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반드시 이를 권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형벌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진실로 이것에서 나온 것을 모르고 儀禮를 침범하여 우리 고을의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곧 하늘의 弊民이라 하겠다. 비록 벌을 없게 하려고 하나 그럴 수 있겠는가? 이에 금일의 약조는 부득불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丙辰年(1556) 臘月(12월) 고을 사람 李某가 序한다.
이상 서문의 주된 내용은 향약의 전통이 三代 향대부 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오랜 유래를 밝히는 것과 李賢輔가 일찍이 약조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사연이다. 이현보는 퇴계와 같은 예안 출신으로 퇴계가 향약을 제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어 고을에서 교화가 이루어지면 나아가 나라의 풍속도 아름답게 될 것이니, 고을의 여러 인사들이 힘써 鄕立約條를 잘 준수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서문 다음의 약조는 퇴계향약의 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원래 퇴계향약은 輕重에 따라 極罰, 中罰, 下罰로 나눈 28개조의 罰條와 鄕吏에 대한 규제 규정 4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 약조도 이것을 거의 따르고 있지만 일부 조항은 선산부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각 조항의 말미에 부기해 놓았다. 약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극벌은 7개조로 퇴계향약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 대상은 부모에게 不順한 자(불효한 죄는 나라에서 정한 벌이 있으니 그 다음 죄만 열거한다), 형제간에 서로 다투는 자, 家道를 어지럽히는 자, 官府의 일에 간섭하는 자, 위세를 부리며 관청의 일을 어지럽히고 사사로움을 행하는 자, 고을의 어른을 능욕하는 자, 수절하는 과부를 속이고 협박하여 간통하는 자이다. 이상 극벌은 다시 경중에 따라 上中下로 나누는데 상벌은 관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고 이웃 간의 교류를 금하며, 중벌은 削籍한 뒤 고을에서 어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벌은 損徒하여 公會에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극벌의 경우 인륜과 관련된 조항이다.
중벌은 퇴계향약과 동일한 16개조와 선산부에서 부기한 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12개조는 친척 간에 화목하지 않은 자, 正妻를 疎薄하는 자, 친구 간에 서로 때리고 욕하는 자, 이웃 간에 不和한 자, 염치를 돌보지 아니하고 士風을 더럽히는 자,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며 침탈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 무뢰하게 무리를 지어 난폭한 짓을 저지르는 자, 公私의 모임에서 官政의 시비를 논하는 자, 말을 꾸미어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자, 患難 때 힘이 있어도 앉아서 보고 돕지 않는 자, 官家에서 差任을 받은 뒤 公事를 빙자하여 사사로움을 취하는 자, 혼인과 喪祭에 까닭 없이 때를 어기는 자, 執綱을 없이 여기며 鄕令을 따르지 않는 자, 집강이 사사롭게 鄕參에 冒入하는 자, 舊官을 전송하는데 이유 없이 불참하는 자이다. 그런데 원래 퇴계향약의 중벌은 13개조이다. 여기서는 ‘향론에 불복하며 도리어 仇怨을 품는 자(不伏鄕論 反懷仇怨者)’라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까닭은 분명하지 않다. 퇴계향약의 중벌은 인륜과 강상을 범하였으나 극벌의 그것보다는 가벼운 벌, 향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벌, 향약 운영과 관련된 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부기된 5개조는 학문을 독실하게 닦지 아니하고 방탕하게 놀며 날을 보내는 자, 술을 좋아하고 방탕하게 주정하는 것을 즐기는 자, 재물의 이익을 經營함에 다른 사람을 救恤하지 않는 자, 人戶를 多接하고 官政을 듣지 않는 자, 세금 내는 것을 충실히 하지 않으며 繇役의 회피를 도모하는 자이다. 이상의 중벌도 다시 상중하로 나누어 다스리되 鄕中에서 벌을 내린다고 하였다.
하벌 4개조는 公會에 늦게 오는 자, 자리를 비워두고 편리한 대로 따르는 자, 어지럽게 앉아 威儀를 잃어버린 자, 座中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자이다. 퇴계향약의 하벌 5개조 가운데 ‘아무 까닭 없이 먼저 나가는 자(無故先出者)’ 조항만 누락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상 하벌도 상중하로 나누어 처벌하는데 좌중이 혹 面責하고 벌을 내린다고 나타나 있다.
향리를 다스리는 4개조는 元惡鄕吏(악의 우두머리가 되는 향리), 人吏와 民間에 폐를 끼치는 자, 공물을 濫徵하는 자, 庶人으로 사족을 능멸하는 자이다. 향리를 다스리는 조항은 16세기 중엽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그들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향리와 하층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조항이다. 유향소의 鄕規에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접목 시킨 향약을 시행함으로써 하층민의 직접적인 통제에 대한 명분을 제공받으려 한 것이다. 이것은 후술할 下人約條의 제정 이유와도 동일하다. 이상 4개조를 어긴 자는 보고 들은 대로 적발하여 官司에 알려 律에 따라 죄를 내린다고 하였다. 이어 선산부에서 시행하기 위해 2개조를 부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官司를 欺罔한 자, 戶首로 作弊하는 자이다.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 농간을 저지를 수 있는 호수에 대한 통제 조항이 주목된다. 조선후기 戶首로써 폐단을 일으키던 자들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성장한 新鄕 세력이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재지사족의 사회적 지위에 도전하며 갈등을 일으키던 자들이었다.
이상의 약조는 향약의 기본이 되는 朱子增損呂氏鄕約 중 過失相規 조항에 해당되는 罰條 만을 열거한 것이다. 이 조항만 제정한 것은 이미 퇴계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향리를 다스리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족에게만 적용되는 약조라는 것이다. 퇴계가 이상이 약조를 만든 까닭은 자기규제를 통해 향촌에서 사족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백성들에 대한 사족의 침탈을 금지하고, 행실을 바르게 지켜나감으로써 사회적 지위에 맞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약조에는 관청 또는 수령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항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향촌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다.
하인약조는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金圻의 향약에서 발췌한 것이다. 김기의 향약은 1602년에 작성된 것으로, 朱子增損呂氏鄕約의 過失相規 조항을 上人約條와 下人約條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상인약조는 퇴계향약의 「향입약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인약조를 첨가함으로써 김기는 하인, 즉 일반 서민층까지 향약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17세기 전후 무렵 재지사족의 향촌지배가 구체화됨으로써 향약을 매개로 실질적인 하층민 통제에 대한 명분을 제공받으려 한 것이다. 이러한 上下人合契 형태의 향약은 고을 단위의 향약보다는 실질적인 사족의 영향력이 미치는 洞里 단위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기에 의해 마련된 하인약조는 후일 동리 단위로 실시되던 洞約 제 규정의 典範이 되기도 하였다. 김기의 하인약조도 퇴계향약처럼 극벌, 중벌, 하벌로 구분되어 있다. 선산부 「향입약조」의 하인약조 대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극벌은 김기향약 하인약조와 동일하며 7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대상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빌어먹게 하는 자, 부모를 따르지 아니하고 悖惡한 행동을 많이 하는 자, 여인으로 시부모를 욕하고 꾸짖는 자, 형제간에 不和한 자, 양반을 능욕하는 자, 유부녀로 몰래 간통하는 자, 傍親의 어른들을 능욕하는 자이다. 퇴계향약과 마찬가지로 경중에 따라 上中下로 나누어 다스리며, 상벌의 경우 관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극벌은 인륜 또는 綱常과 관련된 조항이 주를 이룬다. 특히 양반 능욕자를 극벌로 다스린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벌도 김기향약과 동일한 8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함을 믿고 방자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마을에 해를 끼치는 자, 어린자로 노인을 능욕하는 자, 이웃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자, 絲笠과 紬衣를 입고 벼슬자리를 문란케 하는 자, 양반 앞에서 말을 타고 있는 자, 본업에 힘을 다하지 않으며 농사일에 게을리 하고 안주하는 자, 행동거지가 허황되고 황당한 사람으로 作主하는 자, 遊女와 서로 간통하고 작란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가 해당된다. 하인으로 분수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통제가 주된 내용이다.
하벌은 김기향약과 동일한 4개조와 부기된 2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4개조는 길흉이 있을 때 약조와 같이 扶助하지 않는 자, 公事 때에 아무 까닭 없이 隨行하지 않는 자, 마을에서 높은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는 자, 聚會 때에 술에 취해 떠들고 싸우는 자이며, 부기된 2개조는 喪葬禮 때에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추는 자, 귀신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이다.
이상 약조와 하인약조에 대한 의논은 매월 초하루에 都約正, 副約正 및 各面의 直月이 鄕堂에 모여서 실시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때 약조에 의거하여 論罰하는데 그 行義에 있어 특별이 卓異한 자는 籍에 기록해 두며, 혹은 관청에 보고하여 旌表를 청한다고 하였다. 향약의 하위 구조로 各面에 직월을 두어 향약을 다스리고 있음이 나타난다. 고을의 하부 행정 구조인 面里制와 연계되어 향약 구조가 이루어짐은 조선후기 고을 단위 향약의 특징이다. 이러한 향약은 백성들에 대한 교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지방통치를 도모하는 수령 주도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자료의 가장 말미에는 ‘癸亥更繕’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글은 본 자료를 비롯하여 선산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鄕案과 「一善鄕約節目」에도 기재되어 있다. 癸亥年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一善鄕約節目」이 1834년에 작성된 것임을 감안 할 때, 그 이후의 계해년에 여러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적 가치]
영남지역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향촌자치기구인 留鄕所의 鄕規에 鄕約을 접목시킴으로써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다. 이때 영남지역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향약이 嶺南學派의 종장인 퇴계의 향약이다. 퇴계향약 또는 고을의 이름을 붙여 예안향약이라 불리는 이 향약은 朱子增損呂氏鄕約의 4대강령 중 過失相規 조항의 罰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퇴계향약은 퇴계문인과 그 학통을 계승한 인사들에 의해 영남 각 지역의 향약과 동약, 또는 각종 契 조직의 운영 규정으로 활용되었다. 퇴계향약을 계승한 향약 중에 주목되는 것은 김기의 향약이다. 김기는 퇴계향약을 전범으로 삼되 규정의 적용 대상을 上人과 下人으로 구분하여 향약을 제정하였다. 이중 상인약조는 퇴계향약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하인약조는 향촌사회에서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항으로 김기가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17세기 이후 영남 지역에서 사족과 하층민이 모두 참여하는 향약의 경,우 대부분 퇴계향약과 김기향약을 전범으로 삼고 있다. 조선후기 경상도선산부에서 제정된 「향입약조」도 퇴계향약과 김기향약을 참고하여 제정된 향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