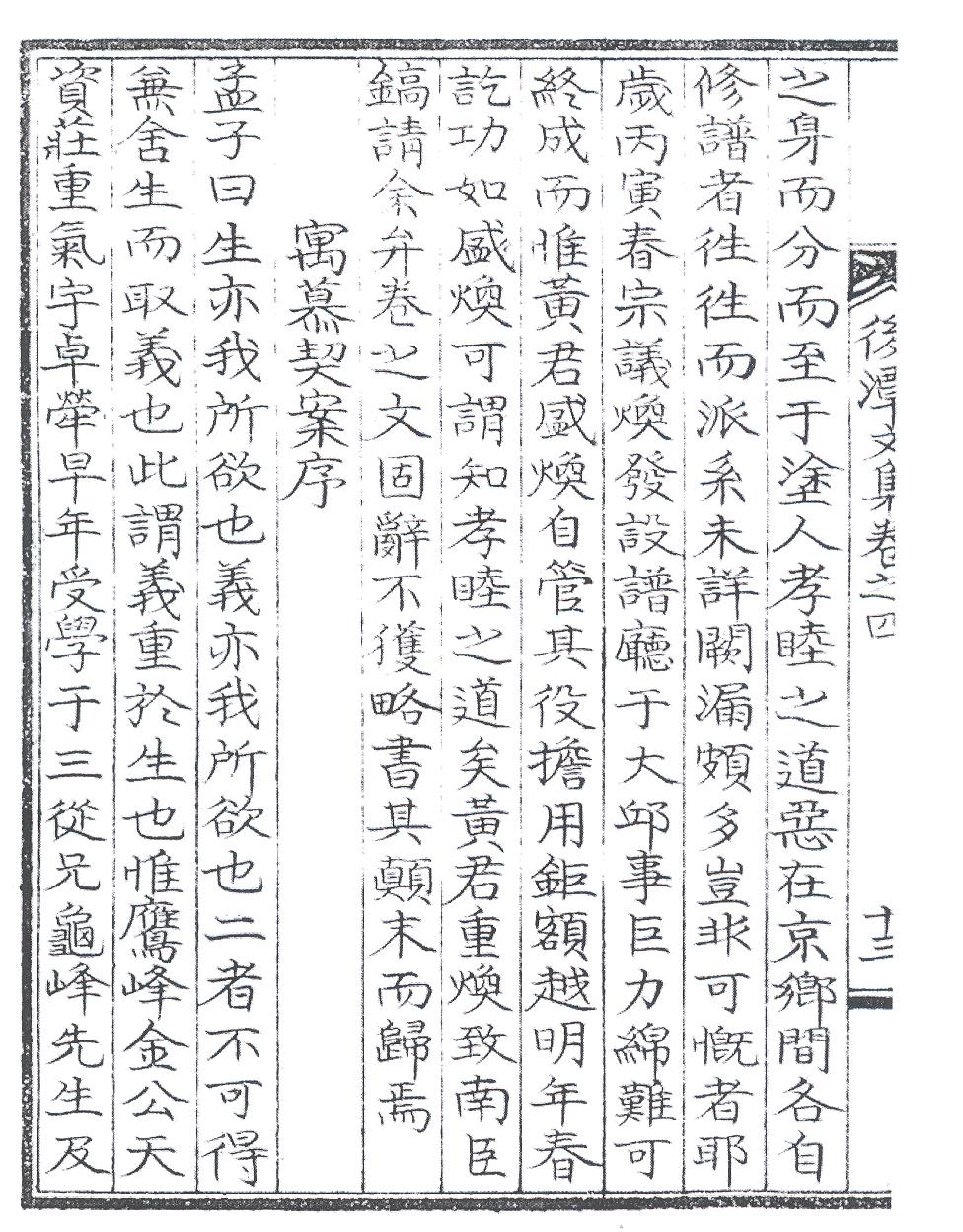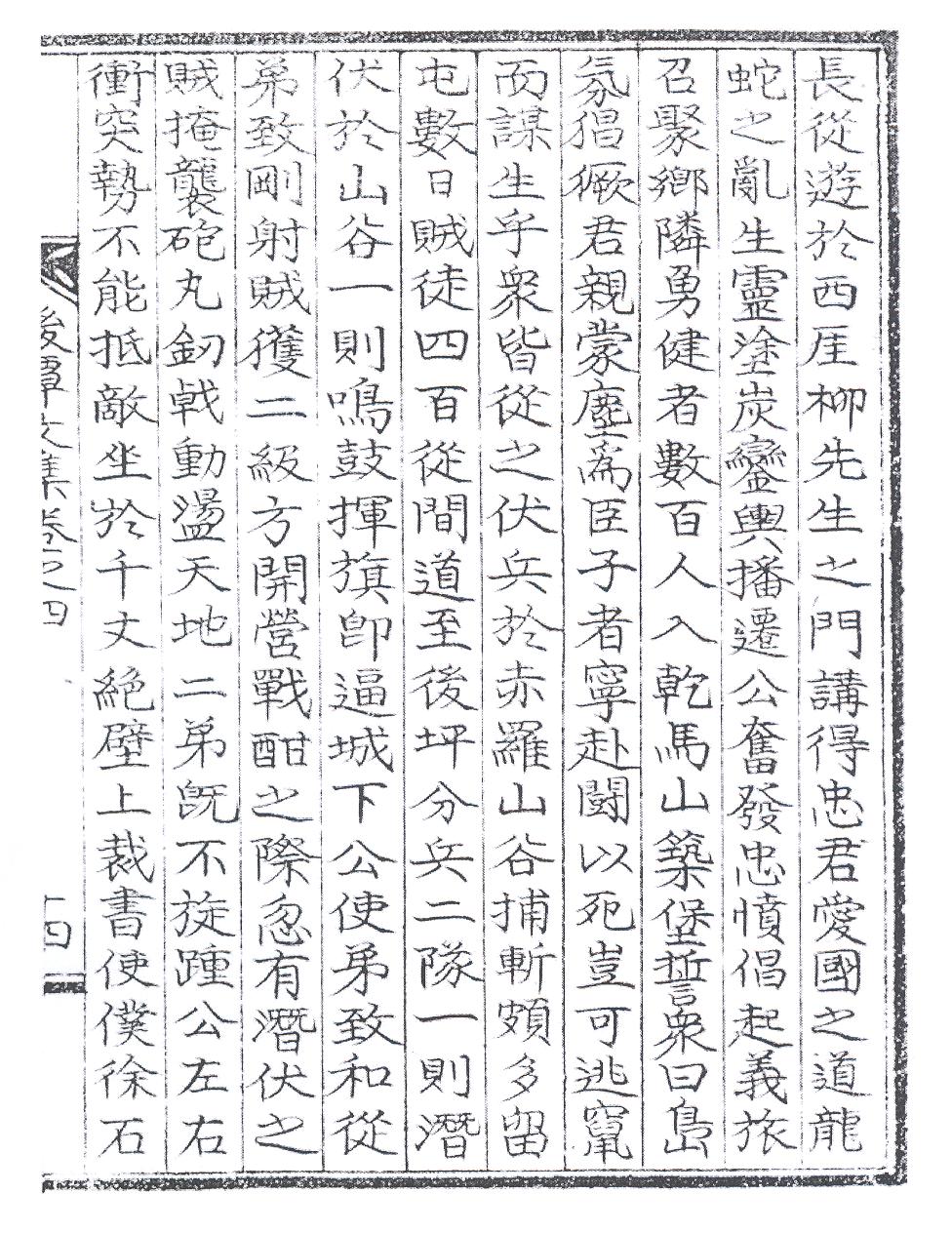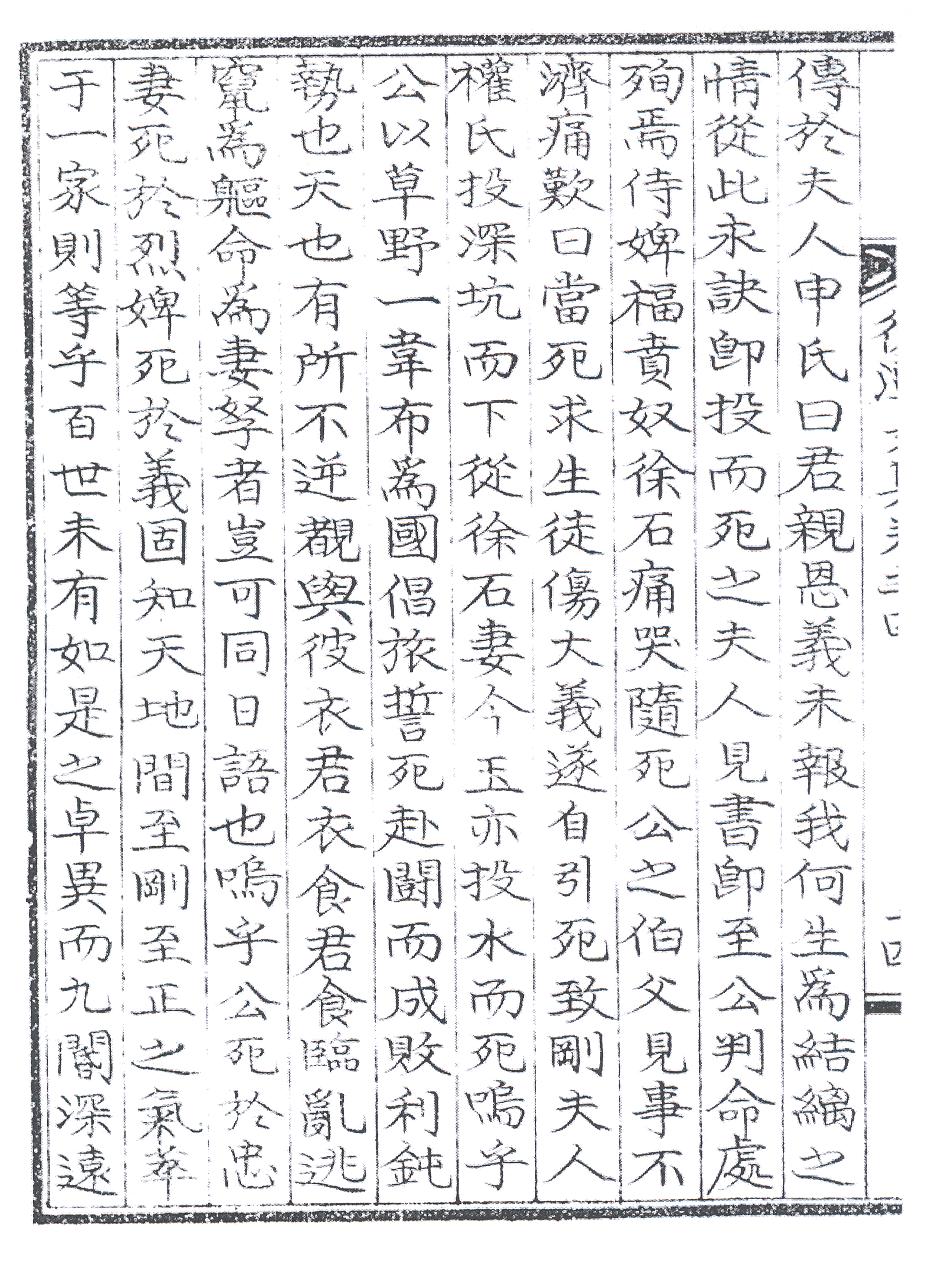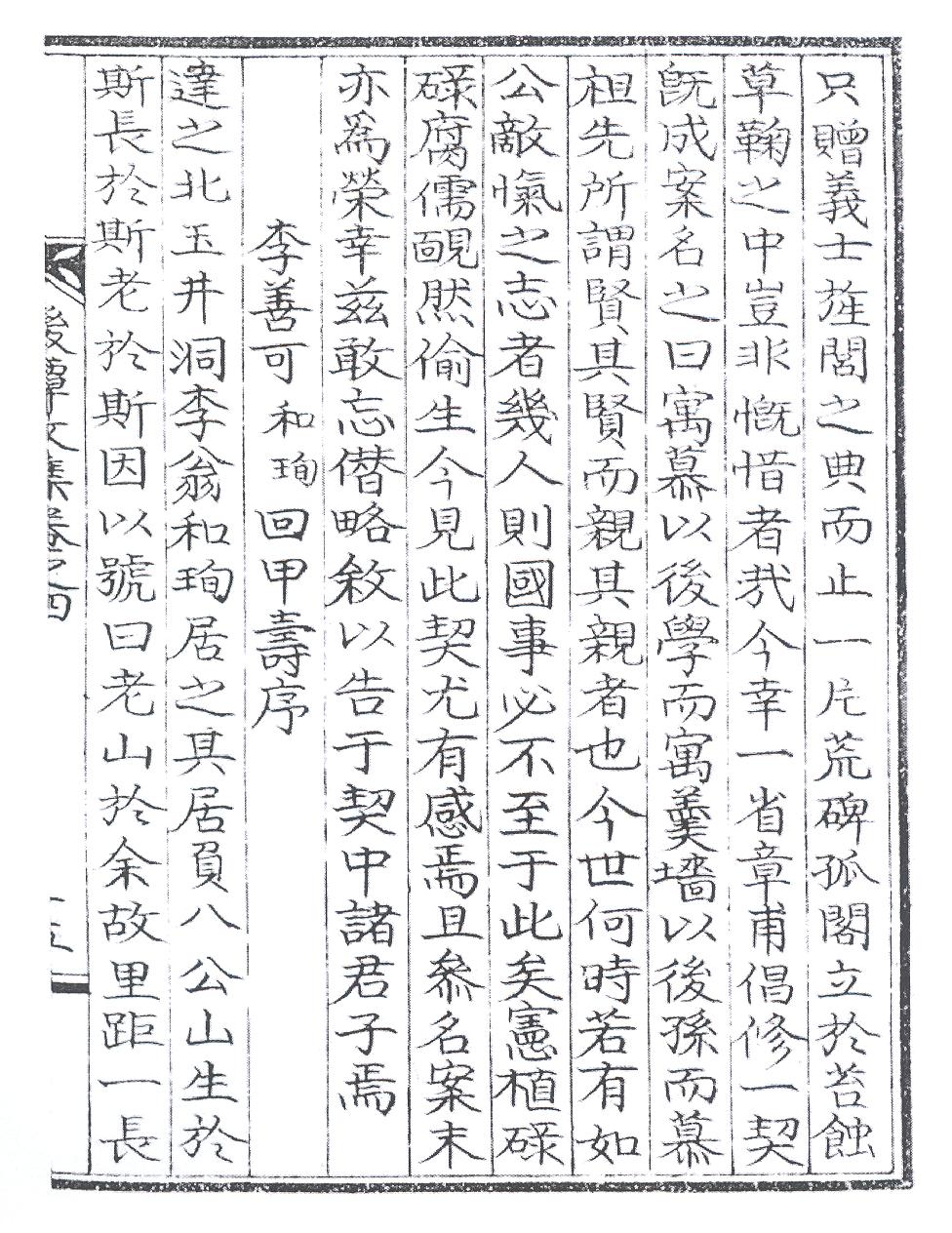鷹峰 金致中을 尊慕하여 만든 寓慕契에 蔡憲植이 동참한 후 그 契案에 적은 序文이다.
後潭集 地序 寓慕契案序後潭文集卷之四 十
天 卷1, 卷2 詩
地 卷3 䟽 書, 卷4 雜著
人 卷5 記, 跋, 祝祭文, 墓誌銘, 墓碣銘, 傳 卷6 附錄
내용 및 특징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寓慕契는 鷹峰 金致中의 충절을 기리고 친족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문에서는 김치중의 학문연원과 임진왜란 당시 의성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그의 의병활동과 순국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함께 목숨을 끊은 부인과 從僕 등의 義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서문의 말미에는 김치중 일가의 정신을 추앙하여 내려진 旌閭와 碑만이 황망히 방치 되어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이것의 수리를 위한 계를 결성한 후 그 이름을 ‘寓慕’라 정하였다고 하면서 우모계의 발원을 말하고 있다. 寓라는 글자는 후학들이 김치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慕는 후손들이 先祖의 덕행(賢)을 기리고,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냄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1903년 오랜 세월에 낡아버린 것들을 改碣하였는데, 본 계는 이때를 전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는 열강들의 대한제국 침략이 본격화 되던 시기였는데, 특히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주권 침탈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1910년 庚戌國恥라 불리는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일제에 복속되었다. 이처럼 우모계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그래서 채헌식은 그 서문의 말미에 지금과 같은 때에 김치중과 같이 외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가진 자가 몇 명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더하여 채헌식은 스스로를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선비이며, 욕되게 살고 있음이 부끄럽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이 계를 보니 매우 마음을 움직이는 바가 있으며, 또한 이 契案의 말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주니 부끄럽고 무안하다고 하였다. 결국 이 계는 국난의 시기를 맞아 族內外의 힘을 결집하고, 김치중의 충절정신을 본받아 당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김치중은 자는 靜而, 호는 鷹峯이며, 본관은 義城이다. 松隱 金光粹(1468~1563)의 외증손이었으며 어릴 때 三從兄인 龜峰 金守一(1528~1583)에게 수학하였는데, 자라서는 姨從叔인 西厓 柳成龍의 문인으로서 從遊하면서 忠君愛國의 도리를 배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임금은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을 하였다. 이에 김치중은 1592년 4월에 鄕隣의 장정 수백 명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켜서 아우 金致和, 從弟 金致弘, 金致剛, 金致恭 및 숙부 金應周 등과 함께 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한 乾馬山에서 堡를 쌓고 왜적에 맞서 싸웠다. 김치중은 그의 동생 김치화, 김치윤이 전사한 것을 보고 곧 스스로 나라와 가문에 조금의 은혜도 보답함이 없었다는 자괴감을 견디지 못해 숙부와 함께 진지를 구축하여 왜적과 싸웠던 건마산 벼랑 꼭대기로 올라가 투신자살하는 비장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내용과 이밖에 그의 從弟 김치강이 전사한 후 김치강의 처 權氏가 골짜기에 몸을 던져 죽고, 김치중의 처 申氏 또한 남편과 영욕을 함께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남편이 자결한 곳으로 올라가 죽었다. 그리고 치중의 복부(僕夫) 徐石과 申氏의 侍婢 福賁이 주인과 주인마님을 위해 그 뜻을 따라 함께 죽었으며, 종 徐石의 처 今玉또한 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이에 사람들은 김치중의 죽음은 忠이며, 처의 죽음은 烈이고 婢의 죽음은 義라고 하며, 천지간의 至剛과 至正의 기운이 한 가문에 모이니 一門 三綱이라 추앙하며, 오랜 세월동안 이와 같은 기상을 가진 다른 것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 후 김치중의 의로운 壯擧를 기려 ""남자의 뜻 굽히지 않고 義로써 마치니 죽음이 아니로다""란 요지의 비석과 비각을 광해 원년(1609)에 세우고 향사케 하였다. 이처럼 김치중이 창의하여 건마산에서 순절한 일은 종제인 金致寬(1569~1661)의 유집인 『亦樂齋集』권3「從兄乾馬山死節時事」에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03년에 김필만, 김사건, 김서화 등의 후손이 낡아버린 정려각을 다시 세웠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우모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後潭文集, 蔡憲植, 1962, 대구광역시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