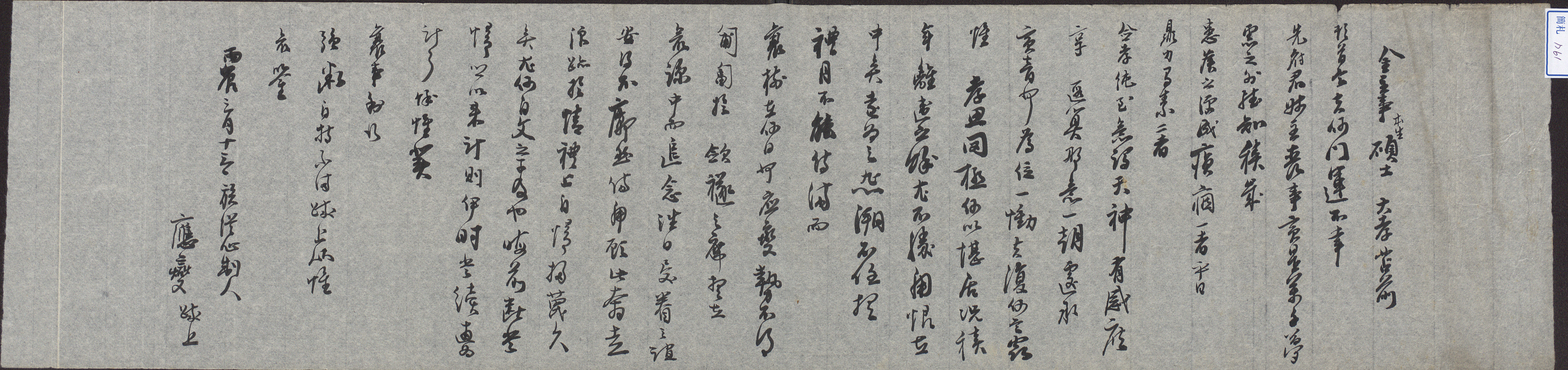1916년 3월 13일, 김응섭이 수를 누릴 줄 알았던 상대 부친의 상사에 위로하고 자신의 상황 상 참석하지 못함을 알리기 위해 김 주사에게 보낸 위문편지
내용 및 특징
1916년 3월 13일에 金應燮(1878-1957)이 金主事에게 보낸 慰狀이다. 발급인 김응섭은 洛厓 金斗欽의 손자인 金秉璿의 아들이다. 그의 자는 景章이고, 호는 東田이다. 그는 漢城法官養成所를 졸업하여, 咸興裁判所檢事를 역임하고 국권피탈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 嶠南敎育會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金東三과 함께 임시정부에 참여해 법무차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후 사회주의자로서의 길을 걸어 고려공산당에 참여하였고 직접 韓族勞動黨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김응섭은 상대의 부친 상사가 실로 천만 뜻밖의 일이라고 하였다. 비록 몇 년 동안의 환후가 고질병을 이루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상대의 부친이 평소 솥도 드는 기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 여러 사람들의 효성이 순수하고 지극하였으므로 상대 부친이 크나큰 수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부음을 받게 될 줄 알았겠느냐고 하였다. 이어 상대가 망극한 심정을 어찌 감내하느냐고 묻고 장삿날은 며칠인지 물었다. 김응섭은 염습하는 자리에 자신이 형편상 나아가지 못한 것을 상대는 양해하고 있을 것이지만 지난날 상대 부친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았던 우의를 추억하건대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끝으로 그믐 전에 기필코 귀향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때에는 마땅히 逋慢한 죄를 갚을 생각이라고 하였다. 장사를 잘 치르고 억지로라도 粥을 들어 보중하라고 했다.
平闕은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특정한 명사를 만났을 때 행을 옮겨 쓰거나 혹은 공간을 띄워서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평은 행을 바꾸는 것으로 擡頭를 말하고, 궐은 글자를 비워두는 것을 隔字 또는 間字를 말한다. 세로쓰기를 할 때, 평상적으로 시작하는 글자의 위치를 ‘平行’이라고 하는데, 대두법을 사용하여 높이 적는 위치를 ‘極行’이라고 한다. 궐은 평처럼 대두를 사용하여 극행으로 올려 적거나 행을 바꾸는 것과 달리 존대를 해야 할 용어를 띄어 적는 방법이다. 이 간찰에서는 ‘患候’·‘鼎力’’·‘僉孝’ 등에 평을 쓰고, ‘孝思’’·‘斂襚’ 에서 궐을 써서 상대방을 높였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金血祚,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풍산김씨세보』,
김장경,최연숙